|
미국 내 16위 은행이었던 SVB는 지난 10일(현지시각)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금융기관 파산으로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당시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투자은행이었던 리먼브러더스는 베어스턴스 사태 여파로 무너지며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었다.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규모가 큰 은행의 파산과 뱅크런, 은행들의 연쇄적인 폐쇄 우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 등을 꼽으며 “2008년 금융위기와 기시감이 든다”고 말했다. SVB가 ‘찻잔 속 태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베어스턴스 파산이 리먼브러더스뿐 아니라 AIG까지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갔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리스크센터장은 “외환시장은 신용으로 돌아가는 시장인데, SVB가 당장 우리나라 신용을 흔들 만큼 직접적인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나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기업인 만큼 전 세계 국가에 지점을 두고 있다는 점, 각국 지점에 미칠 영향이 글로벌 금융시장 차원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한층 커졌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지난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을 비롯한 고금리 정책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중 최대 1440원까지 치솟았다. 1200원선부터 1400원선까지 널뛰기 환율이 이어지면서 은행들은 기업 외화 대출을 바짝 죄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내 은행들은 상당 기간 달러화 부족 현상에 시달려야 했다. 달러에 대한 수요는 넘치는 반면 공급선은 점점 줄면서 달러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또 위기를 느낀 외국인들의 주식·채권을 팔아 치우면서 달러 수급에 차질을 빚었다. 기업에 외환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입장에선 달러 유동성 악화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수출입기업과 같이 환율 민감도가 높은 회사들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과 달리 국가경제 안전판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이 아직까진 충분하고,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역시 안정적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4252억9000만달러(약 553조7000억원)이다. 2월 외환보유액은 전달 대비 줄긴 했으나 직전 석달 간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달 10일 기준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143.7%로, 2월(132%) 대비 상승했고 규제비율(80%)도 상회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한국의 대외건전성과 외화유동성이 튼튼하다는 게 은행업계 안팎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열린 ‘금융상황 점검 회의’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현 상황보다 커지더라도 아직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공채 보유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의 보유 만기가 길지 않고 은행 역시 이를 대비해 사전조치를 착실히 실행해왔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SVB가 실리콘밸리 특화은행인 데다 국내 외화보유액, LCR 비율 등 외화 관련 건전성·유동성 수치가 안정적이여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진 않다”면서 “다만 환율은 금리와 글로벌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환율을 둘러싼 금융시장 상황을 더 면밀히 지켜보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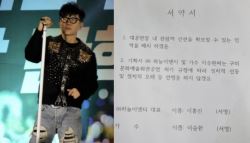

!['7억8000만원' 로또 1등 남편 살해한 여성이 한 말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4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