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트립in 임택 여행작가] 2014년 10월 25일. 은수가 첫 여행지 페루의 리마로 떠났다. 은수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대략 50여 일을 항해한 후 그곳에 도착한다. 우리 일행들도 은수가 도착하는 날에 맞추어 비행기로 떠날 예정이었다. 나는 12월 1일 한국을 떠날 생각이었다. 비행기 표를 끊고 나니 가족들의 마음도 한층 바빠졌다. 그동안 여행 준비로 가려졌던 가족이 고스란히 다가왔다.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했던 가족이다. 어쩌면 이러한 나의 모습에서 자신들이 소외되어 있다는 서운함도 있었겠다. 떠날 날이 다가오자 딸 채린이가 제안을 했다.
“아빠 우리 마지막으로 가족여행 떠나요.”
우리 가족은 제주도로 이별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아빠가 없는 동안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삼갔다. 먼 여행에서 겪을 어려움과 두려움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걱정 보따리는 폭발력이 컸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남미의 아름다운 자연과 신비스러운 잉카와 마야인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마음속에 있는 걱정들이 묻혀가는 듯했다. 서로의 마음을 다듬어 내어놓느라 애쓰는 것이 역력했다. 재밌는 이야기로 한바탕 웃다가도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다. 대화는 접촉 불량의 전구처럼 깜빡거렸다.
“아빠, 내년 7월까지는 돌아오실 수 있어요?”
여행 이야기를 자르며 딸이 갑작스러운 질문이 나를 허세로부터 깨웠다.
“왜? 아마도 내년에는 들어오기 힘들 것 같은데.......”
순간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그 얘기일 거야. 결혼.’
당시 채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항공사에 다니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결혼을 하려고 해요.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언제쯤 여행을 마치시는지 궁금해서요.”
얼마 전 아내로부터 딸이 결혼을 염두에 둔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 결혼
은 내 여행이 끝난 후여야 가능한 일이었다. 여행은 언제 끝날지 확정할 수 없으니 나는 모른 척을 하던 차였다.
“그럼 내후년 3월에는 돌아오실 수 있을까요?”
“그럼 그때면 충분히 돌아오지. 약속할게”
딸은 아버지가 일 년 후에도 돌아오지 못하리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결국, 12개월을 계획했던 나의 여행은 22개월을 넘기고서야 끝났다. 나는 여행 도중 잠시 일정을 중단하고 딸의 결혼식을 위해 귀국해야만 했다.
집을 떠나는 것은 나만이 아니었다. 아들 채욱도 곧 집을 떠나야 했다. 네덜란드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 것이다. 평생 고슴도치처럼 뭉쳐 살아왔던 가족이 콩가루처럼 흩어지게 됐다. 아내는 내면이 강한 여자다. 허세가 심한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어려움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면에서 나와 아주 다르다. 이런 아내가 그동안 마음속으로 삭여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내가 떠나면 기댈 기둥은 아들이었는데 이 아이마저도 집을 떠나야 했다. 아내를 지탱해 주고 있던 울타리가 무너져 내렸을 테지만 나는 늘 아내는 강하다고 생각했다. 차만 실어 보내면 다 끝난 줄 알았던 걱정이 산더미처럼 몰려왔다.
이제 떠나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가족들과의 시간도 이토록 귀중할 수가 없었다. 아내는 떠나는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집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요.”
아내는 끙끙거리며 고민하는 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며 위로했다. 아내의 배려와 도움은 나의 큰 재산이었지만 미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일 년이라는 기간은 우리 부부에게 남은 인생의 길이를 생각할 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일 년간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아내가 너무도 마음에 걸렸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두려움과 걱정을 한 보따리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내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정작 나의 위안이었을 것이다. 담대해 보였던 아내도 떠나는 날이 다가오자 그 나약함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는데 이런 날이면 아내의 앓는 소리가 잠꼬대를 타고 흘러나왔다. 어떤 때는 알아듣지 못할 말로 잠꼬대도 했다. 아내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밤이 늘어만 갔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민 거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나약해진 마음속에 후회가 끼어들었다.
떠나기로 한 날이 무섭게 달려오고 있었다.
|
2014년 12월 1일. 나보다 열흘이나 먼저 떠난 일행들의 뒤를 따라 페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인천공항까지 마중을 나온 가족들과의 이별은 큰 인내가 필요했다. 우리는 애써 다른 이야기를 하며 진심을 감추려고 애썼다. 테이블에 앉을 때도 울음이 많은 딸 채린이의 눈을 피하려고 딸과 나란히 앉았다. 우리 식구 중 나를 닮아 눈물이 많은 딸이다.
“건강 조심하고 밥은 잘 먹고 다니도록 해요.”
“위험한 곳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세요.”
늘 말없이 조용하던 아내가 말이 많아졌다. 우리는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 점심을 먹었다. 무엇을 먹었는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밥을 먹는 내내 ‘나는 울지 않을 거야’라고 다짐했다.
“아버지 항상 가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유럽에 오면 저도 아버지 차 탈게요. 함께 여행해요.”
한 달 후에 네덜란드로 떠나는 아들과 유럽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아버지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가야 해요.”
이 순간 코끝이 시큰해 왔다. ‘아! 그분이 오셨군.’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아내와 포옹을 했고 차례로 아들과 딸을 안았다.
“아버지 없는 동안 엄마를 잘 부탁해.”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꿈을 이루세요.”
아들이 격려의 말을 하는 동안 딸은 이미 훌쩍거리고 있었다.
“아버지 잘 다녀.......”
나는 서둘러 출국장으로 향했다.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다. 더 늦으면 대성통곡이 벌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가족들에게 매정하게 보일 것 같았다. 나는 자신 있는 표정을 지으며 가족들을 향해 돌아섰다. 가족들은 나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손을 흔들었다. 돌아선 나도 손을 흔들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채린이가 급히 고개를 돌렸다. 식구들도 손을 흔들며 돌아섰다. 나는 재빨리 출국장 속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이렇게 세계 속으로 아버지는 사라졌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적어도 가족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입고 있으니 그렇다. 나는 가족이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등에 업고 내 꿈을 향해 떠났다.
여행을 떠나고 얼마 후 딸은 회사 웹진에 나에 관한 글을 썼다. 제목은 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는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내가 좌절할 수 없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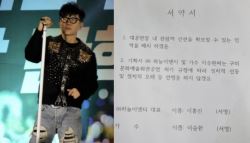

!['7억8000만원' 로또 1등 남편 살해한 여성이 한 말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4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