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회장은 1983년 1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30년간 쌍용건설을 이끌어 왔다. 회사와 영욕의 시간을 함께한 그에게 찾아온 첫 시련은 IMF 외환위기였다. 쌍용건설은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11월 첫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 때문에 경영 일선에서 잠시 물러났던 김 회장은 채권단의 요청으로 대표이사로 복귀해 6년만에 워크아웃 졸업을 성공시켰다.
끝난 줄 알았던 그의 시련은 그러나 이때부터가 시작이었다. 2003년 이후 캠코와 채권단 관리를 받아온 쌍용건설은 워크아웃 졸업 후 매각이 추진됐으나 연이은 실패로 난항을 겪었다.
1차 매각이 추진된 2008년 당시 주당 3만1000원의 가격을 제시한 동국제강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캠코와의 가격 협상이 결렬돼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대주주였던 캠코는 쌍용건설을 다시 매각하기 위해 2011년말부터 독일계 엔지니어링업체인 ‘M+W’과 홍콩계 시행사 시온, 국내기업인 이랜드 등과 5차례나 매각 협상을 벌였으나 이 역시 모두 불발로 끝났다.
|
해외에서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쌍용건설은 연이은 매각 실패와 극심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2년 연속 적자를 냈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
캠코는 부실 경영과 유동성 위기의 책임을 김 회장에게 돌리고 있다. 김 회장의 해임 안건은 오는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채권단의 합의가 이뤄진 27일 오전 임직원 회의에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재무구조개선을 거쳐 반드시 회사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
▶ 관련기사 ◀
☞쌍용건설, 신용등급 CCC로 강등
☞쌍용건설 워크아웃 신청…김석준 회장 거취는?
☞쌍용건설 채권단에 워크아웃 신청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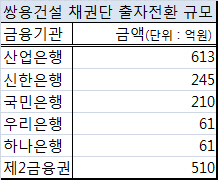
![SK, 역대 최대 5조1575억원 자사주 소각 결정…애프터마켓 10%대 급등[특징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00141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