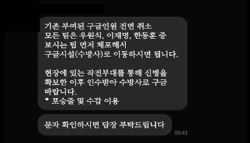범야권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빅3 구도를 형성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주인공이다. 빅3 구도가 야권 흥행에 청신호를 켰지만, 후보들 간에 신경전도 치열하다. 그 중 하나가 이들 셋을 표현하는 약칭이다.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면서 후보들 간 일희일비하고 있다. 가장 먼저 불리면 앞서 있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일화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어 우위를 점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
또 다른 관례도 있다. 바로 선수(選數)다. 즉, 다선일수록 먼저 쓰고 초선이 마지막에 자리하는 순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이낙연(5선), 김부겸(4선), 우상호(4선) 순으로 쓴 것도 이 때문이다. 김부겸 전 의원과 우상호 의원의 경우 선수는 같지만 ‘가나다’ 순과 ‘연령’에서 김 전 의원이 앞선다.
3김(金)정치(김영삼·김대중·김종필)란 표현은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54년 제3대 민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5대 민주당 민의원으로 활동하며 정가에 문을 두드렸고, 김종필 전 총재는 1967년 제7대 국회의원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선수로 따지면 김영삼(9선) 전 대통령과 김종필(9선) 전 총재가 김대중(6선) 전 대통령에 앞선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재의 순서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대통령 당선 유무에서 갈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며 꿈을 이뤘다. 반면 김종필 전 총재는 아쉽게 대통령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듯 정계에서 후보 간 약칭은 복잡하고 다양한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치 관례상 약칭을 쓸 때 집권여당을 먼저 표기해준다”며 “약칭의 앞자리는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후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각 캠프마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준을 정해 표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