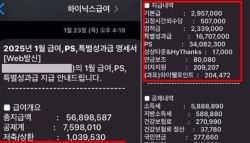|
그간 미국 채무한계 협상, 영국 미니예산 등 재정정책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검증은 부족했다. 특히 기존 정책 불확실성 연구는 소수의 주요국에 국한돼 있었다.
응우옌 이코노미스트는 뉴스 기사를 활용해 189개국의 국가별·글로벌 재정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구축한 후, 미국·미국외선진국·신흥시장국 세 그룹의 산업생산과 국채 스프레드 등 실물·금융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재정정책 불확실성은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여건 악화를 초래했다. 특히 신흥시장국 금융시장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재정정책 불확실성이 1표준편차가 상승할 경우, 산업생산은 4개월 내에 최대 약 0.5% 하락했고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
단일 국가보다 전세계적인 재정정책 불확실성의 파급 효과가 더 컸다. 국가별 재정정책 불확실성 충격은 산업생산이 0.2%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글로벌 재정정책 불확실성 충격은 산업생산이 0.3% 감소하는 등 경기 위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국제무역과 금융 채널을 통해 글로벌 재정정책 불확실성이 국가 간 전이효과로 나타날 시에 산업생산은 0.6%로 더 위축됐다.
또한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국채 스프레드 확대가 두드러졌다. 금융시장에서는 선진국의 국채 스프레드가 12bp 상승하는 반면, 신흥국 채권지수 스프레드는 최대 50bp까지 확대됐다.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투자자들은 더욱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프레드의 확대는 주식 시장 변동성,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통화정책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응우옌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재정정책 불확실성은 글로벌 금융 사이클을 10%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그 효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5bp 금리 인상을 하는 긴축정책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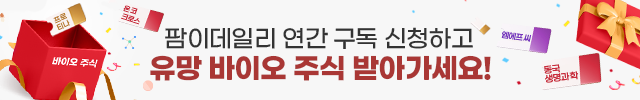





![[단독]`전광훈 자금` 댄 보수 유튜버, 더 있었다…수천만원 송금 정황](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8/PS25081101106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