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소연은 가상 공간과 시뮬레이션을 매개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심리적 감응을 실험하는 가상의 연구소, ‘남소연구소(namsoyeonguso)’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실제 의뢰인으로부터 수집한 ‘의뢰서’를 출발점으로, 일상에서 겪는 불안, 갈등, 욕망 등을 다루는 ‘유쾌한 해소’를 위한 특별한 도구들을 상상하고 제작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의뢰서들과 더불어, 그에 기반하여 설계된 도구들이 함께 소개된다. 사적인 고민을 수집해 공적 메시지로 전환한 ‘namsoyeonguso Site에서 데려온 공지판’, 몸의 긴장을 투척 행위로 날려 버리는 ‘투척! 심신부유 벨트’, 빛 신호로 소통하는 ‘광촉정보공유기’, 과거 감각을 얼려 현재로 이송하는 ‘잔상동결 흡출기’는 분석이나 논리를 넘어 신체와 감정이 기술을 통해 흘러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가상·현실·감정이 한데 얽힌 이 장치는 소소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욕망과 불안을 장난스러운 시선으로 뒤집어 보게 한다.
착용형 외골격 수트가 퍼포머의 몸 위에 낯선 각도를 그린다. 뇌파 데이터가 와이어를 당겨 팔 움직임을 강제하고, 퍼포머는 통제와 자율이 교차하는 상황을 몸소 연주한다. ‘정상적’인 감각 구조가 흔들리면서 관객은 감각의 주체가 누구인지 질문받는다. 시리즈를 통해 작가는 감각이 기술에 의해 복제·전송될 때 발생하는 불일치와 새로운 감응을 탐구해 왔다.
이인강은 기술과 신체, 감각의 관계를 탐구하며 기존의 정상성(nomativity)에 기반한 신체 기준과 감각 구조를 해체하고, 그 경계 밖에 있는 몸을 통해 세계를 다시 사유함을 중심으로 작업을 펼치고 있다. 직접 만든 착용형 외골격 ‘Drawing Suit’와 ‘Performing Suit’ 시리즈는 움직임을 캡처해 몸에 되돌려 주며 감각을 옮긴다. 이 과정에서 원본-복제, 창작-전달의 경계를 넘나들고, 감각과 정체성이 기술 속에서 어떻게 유동적인지 드러낸다. 그의 퍼포먼스는 신체 이질성과 감각 교란을 통해 현실이라는 고정 틀에 금을 내고, 현실과 가상이 새롭게 얽히는 접점을 열어 보여준다.
도시와 데이터의 층위를 탐색해 온 이재형은 SNS에서 추출한 실시간 감정값으로 얼굴 이미지를 변조하는 ‘Face of City’로 도시 무의식을 시각화한다. 곡면 LED 패널을 동물 형태로 구부린 ‘Bending Matrix’ 시리즈는 픽셀 이미지가 아날로그 곡면에서 일그러지며 기이한 생명성을 띄게 한다. 정보 흐름과 감각 경험이 얽히는 순간, 관객은 도시가 품은 숨겨진 정동을 마주하고 데이터 기반 세계관이 인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하게 된다.
회화와 미디어를 넘나들며 감각, 언어, 정체성 사이의 경계를 실험하고있는 이해강은 신작 회화 ‘도깨비 기운’에서 전통 도깨비 도상을 팝 컬러, 애니메이션 프레임, 인터넷 밈과 충돌시켜 운명과 선택, 전통성과 유희 사이의 경계를 희미하게 뒤섞는다. 또 다른 작품 ‘Final Fla.sh’는 터치패드를 통해 관객 스스로 음악과 영상을 리믹스하게 해 즉흥적 시청각 조각을 생산한다.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그는 디지털 툴을 물성과 동일 선상에 두고 손동작·리듬·픽셀을 하나의 회로처럼 연결한다.
|
가상과 현실, 기술과 신체, 환경과 사회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감형 미디어 설치 작업을 지속 중인 한승구는 두 개의 도시 서사를 배치한다. 디스토피아 실감형 미디어 설치 프로젝트 ‘소멸의 도시’는 고령화와 생태 파괴로 붕괴해 가는 지역을 디스토피아 풍경으로 재현하며, 관객에게 도시 소멸을 퀘스트처럼 체험시킨다. 반면 키네틱 아트와 XR 기반 인터랙티브 프로젝트인 ‘공존의 도시’는 다이크로익 구조물과 HMD가 연동되어 증강된 미래 생태계를 그려, 인간·자연·도시의 새로운 공존 가능성을 감각화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멀티채널 영상과 그에 연동한 XR 시스템을 선보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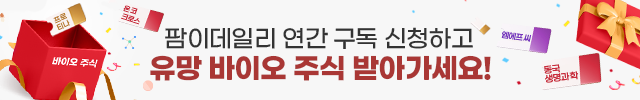








![이재용 나와라…'단체교섭' 쓰나미 덮친 대한민국 미래[슬기로운회사생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8/PS25080200272t.jpg)


![월 305만원 평생…국민연금 대박 비법 보니[연금술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8/PS25080200229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