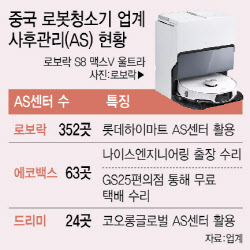|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에서 집 한 채가 팔리는 데 평균 1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가 일상화하며 주택 수요가 늘어났고, 역대급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사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미부동산협회(NAR)을 인용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미국에서 주택 매물로 나와 계약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주일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1년 전 평균 3주가 걸리던 것에서 대폭 짧아진 수준으로, 1989년 관련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단기간이다.
코로나19 이후 매물은 줄었지만, 일단 주택 매물이 나오면 1주일만에 팔리면서 주택 거래 건수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화하면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이 꼽힌다.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대출도 수월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계의 지출은 줄고 저축은 늘었으며, 주식 강세장을 타고 자산을 축적한 가계들도 많아 주택 수요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주택 매물은 줄었다. 집 주인들이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자신의 집을 공개하는 걸 꺼려 매물을 거둬들였고, 기존 주택 소유주들은 낮은 주담대 금리로 인해 유지비용이 줄면서 매물이 급격히 줄었다.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주택 구매자들은 앞뒤를 재지 않고 매매를 결정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 중에서는 주택 실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나 집값이 고평가됐다고 판단할 경우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기하기는 경우도 많다고 WSJ는 전했다. 이전까지는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구매자 권리가 치열한 입찰 경쟁 속에 사라진 것이다.
판매자의 입김이 세지면서 주택 매매가도 올랐다.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미 주택 매매가 중앙값은 집주인이 정한 호가와 같은 수준이었다. 통상 주택 판매가가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보다 낮게 팔리는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 기간 미 주택 가격 중앙값은 지난해보다 3만2500달러 늘어난 30만5000달러로, 200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