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공증 업무가 국가사무의 일종으로서 분쟁 예방과 증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A씨는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담당하는 변호사로, 재판 업무 등으로 사무실에 없을 때도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자신이 미리 서명한 인증서 말미를 같은 법인 직원인 B씨에게 건네주었다. B씨는 이를 받아 공증이 필요한 문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인증 업무를 처리했다.
이들은 2022년 2월 한 주식회사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하면서 A씨가 대표이사 등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거나 의사록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를 발급했다. 이를 포함해 총 6건의 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공증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공정증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공증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이 사건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아닌 형량이 더 낮은 공증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증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며, 법인 의사록은 사서증서의 인증에 해당해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허위로 인증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또한 공증인법상 처벌조항과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규율 대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증인법은 인증 절차와 방법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를 만드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생각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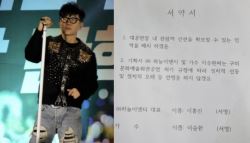

!['7억8000만원' 로또 1등 남편 살해한 여성이 한 말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4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