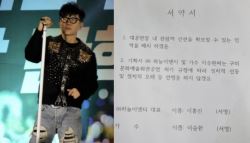|
테러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미국에서 테러리스트 색출 작업에 협조를 강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테러 저지하는 활동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사용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적지 않다.
지난 8일(현지시간) 다이앤 펜스테인 상원의원과 리처드 버 상원의원은 IT 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수사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테러 수사에 IT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슬람국가(IS) 등 테러단체가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테러 색출에 관한 IT 기업에 대한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유력 대선주자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도 민간 IT 기업들이 정부의 테러리스트 색출을 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클린턴은 최근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의 한 강연에서 “정부와 민간 IT 기업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IS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단일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영리 씽크탱크인 CSIS의 제임즈 레비스 연구원은 “안보의 문제가 직면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는 IT 기업들이 테러리스트 문제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업체인 페이스북측은 “테러리스트 활동과 테러를 지지하는 선전활동 등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다는 입장”이라며 “즉각적인 위험이나 계획된 테러를 인지하는 순간 관련된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자칫 민간 IT 기업이 테러리스트 색출을 위한 정부 기관의 ‘하도급 업체’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
뉴욕에 위치한 사이버보안 업체 플래쉬포인트의 수석 과학자 랜스 제임스는 “안보는 정부의 일”이라며 “민간 기업들의 경찰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건 경찰의 일”이라고 말했다.
레비스는 “IT기업들은 곤란한 상황이 빠져 있다. 안보 문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