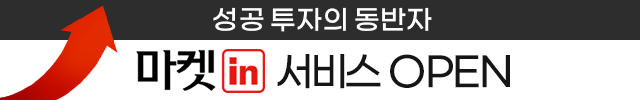|
A씨는 2018년 8월 29일 밤 10시경 경기도 의왕시 소재 회사 숙소에서 동료인 B씨와 술을 마신 후, B씨가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검찰 조사를 받은 후 2018년 11월 중국으로 출국했으며,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B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B씨가 출국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검찰 측 설명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외국 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B씨의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씨 진술조서를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가 수사 과정에서 ‘곧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거듭 말했음에도 검찰이 외국 연락처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출국을 미루게 하는 등 직접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2심 재판부는 중국 사법당국에 국제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중국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이뤄진 B씨의 신문기록을 증거로 인정했다. 중국 법원에서 B씨는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으며, 이는 상해진단서 등 다른 증거와도 일치했다. 이에 2심은 1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형사사법 공조절차에 따라 취득된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따라 외국 사법당국에서 실시한 수사 기록도 국내 법원에서 유효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립했다. 특히 피해자나 증인이 외국으로 출국한 상황에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