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표준계약서를 놓고 정부와 각을 세웠던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이번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출판전산망)을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출협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을 7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해 출판계 혼선이 예상된다.
|
윤철호 출협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출판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을 7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출판사들이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영풍문고 등 대형서점의 SCM망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도서 판매수량 정보를 통합해 저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이 오는 9월 출판전산망의 정식 개통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출판전산망은 도서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출협 시스템처럼 저자가 직접 자신의 책 판매량을 확인하는 기능은 없지만, 출판사가 전산망으로 집계한 자료를 저자에게 제공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판매량 확인이 가능하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출협의 발표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출협이 밝힌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당장 출판전산망과 충돌할 부분은 없을 것 같지만,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건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2개의 서로 다른 전산망이 생기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출협 시스템과 같은 기능을 출판전산망에도 구축하려고 했지만 출판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쉽지 않았다”며 “다음주 출협을 대상으로 출판전산망 시연회를 갖는데 이 자리에서 출협 시스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출협과 정부는 올해 초 출판계 표준계약서를 놓고 대립했다. 문체부의 출판계 표준계약서 도입에 맞서 출협이 출판사 의견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표준계약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 출협의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도 정부의 출판전산망에 맞불을 놓는 것 같은 모양새다.
출협과 정부가 대립하는 이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겪으면서 출판계가 정부 주도 출판 사업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출판계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원화’”라며 “표준계약서도 정부가 만든 단 하나의 계약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계약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출판전산망 등 출판계 혼선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가 네이버도 들어가고 구글도 들어가는 것처럼 출판전산망과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도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공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출협과 정부가 주도권 다툼을 하느라 정작 더 중요한 논의는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소 출판사 대표는 “판매량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출협과 정부가 주도권 다툼만 하고 있다”며 “책 판매량 이면에 있는 위탁 시스템·복잡한 유통구조·결제 시스템 등 문제에 대한 고민은 쏙 빠져있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작가들은 어떤 통합전산망이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현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장은 “정부든 출협이든 작가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반복되는 인세누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체가 누구인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수 출판평론가는 “과거 블랙리스트 등으로 판매 정보를 공개하기 조심스러운 출판계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통합전산망이 두 개가 돌아가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하나의 통합전산망으로 합치되, 운영 주체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누구에게 어디까지 공개할지의 정보 공개 원칙부터 감시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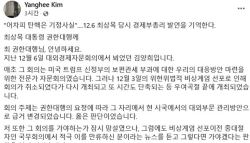


![문가비, 침묵 깼다 정우성에 임신으로 결혼 요구한 적 없어[전문]](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80007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