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 학점이 아니다. 3월 첫주부터 4월 첫주까지 한국갤럽이 조사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지지율 추이다. 지난 2월 추이도 크게 다르진 않다. 유 후보는 지난 1월 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한번도 5%벽을 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비교가 민망한 수준의 격차다.
지지도는 곧 국민적 관심을 뜻한다. 이는 대선 후보의 일정을 밀착 취재하는 기자, 일명 ‘마크맨’ 숫자와도 비례한다. 모든 언론사는 ‘지금 이 시점’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인력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위한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사흘간(6~8일) 유 후보는 경남·경북을 바삐 오가며 지방 일정을 소화했다. 창원·포항·부산·대구 등에 위치한 시장을 돌며 바닥 민심을 훑었다. 기자를 포함해 약 25명 가량의 마크맨이 따라붙었다. 대형 관광버스 1대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인원이다. 그나마도 토요일(8일)엔 주말인 탓에 남아있던 취재진이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문 후보도 안희정 충남지사를 만나고자 충남도청을 방문했다. 70여 명의 마크맨이 몰렸다. 민주당은 2대의 버스를 빌렸다. 1대는 언론사들의 마크맨으로 빈 자리없이 가득 찼으며 나머지 1대도 절반 이상 찼다. 여기에 회사 차량으로 직행하는 인원까지 합치면 100여명의 취재진이 따라붙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문 후보를 오차범위 내로 바짝 추격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9일 광주 일정에도 40명 이상의 취재진이 몰렸다. 지지도와 취재진 규모는 냉혹히 비례한다.
뿐만 아니다. 낮은 지지도에서 비롯된 유 후보의 굴욕은 지방 일정에서도 종종 목격됐다. 일단 지난 1월 창당한 ‘바른정당’의 낮은 인지도가 발목을 잡았다. ‘거기가 어데고’라고 묻는 상인들이 꽤 많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 푸대접을 받는 것에는 꽤 익숙한 듯 보였다.
행사 포커스가 주인공인 유 후보가 아닌 김무성 선거대책위원장에게 쏠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지역구인 부산에서는 그런 경향이 더욱 심했다. 직전 새누리당 대표를 2년 간 지낸만큼 인지도가 높았다. 김 위원장 역시 주인공인 유 후보보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에 곤혹스러워 했다. 행사 중간중간 지지자들이 ‘김무성’을 연호할 때마다 민망한 듯 종종 “내 이름 그만 부르소”라고 눙치기도 했다.
유 후보가 기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낮은 지지율 극복방안’ ‘후보단일화’ 관련 내용이다. 정책 기자회견에서도 포커스는 이쪽에 맞춰진다. 모두 낮은 지지율 탓이다. 누가봐도 현재의 지지도로는 대선 ‘필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실 유 후보는 누구보다 정책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범생’후보다. 대선 출마선언 이후 공약 기자회견을 9번이나 했다. 매주 1개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은 ‘연대’ ‘필승전략’ 등에 쏠렸다.
“진정성을 믿고 가겠다. 국민들이 언젠가 알아줄 것이다” 낮은 지지율에 대한 복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유 후보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백번 맞는 소리지만 현재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기엔 임팩트가 부족하다. 하지만 유 후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어쩌면 지금 나온 5인의 대선후보 중에서 진심이 아닌 사람은 없다. 진심은 진심만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진심을 잘 전달하기 위한 ‘잘 설계된 우회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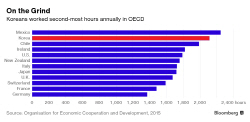


!['190억 펜트하우스' 장동건♡고소영의 집 내부 어떤가 봤더니…[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080009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