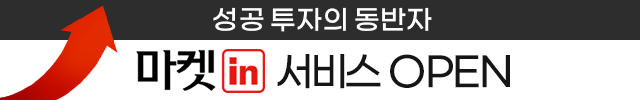◇ 협상 상대는 미국
실무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97년 11월30일.
데이비드 립튼 미 재무차관이 비밀리에 입국했다. 립튼 차관은 미 재무부에서 IMF를 관할하는 책임자였고, 당시 한국 상황에선 그가 곧 IMF였다.
협상장은 힐튼호텔 19층이었고, 립튼 차관은 이 호텔 10층에 여장을 풀었다. 나이스 단장은 부지런히 10층을 들락거리며 차관의 지시를 받아 왔고, 협상장에 돌아와선 이를 그대로 요구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의 IMF행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국 정부에 ‘한국에 자금을 빌려주지 말라’며 압력을 넣기까지 했다. 일본과 중국에 돈을 빌리러 갔던 정부 대표단은 “IMF로 가지 않으면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협상이 막바지에 들어서자 미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은 11월28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했다. “12월 첫째주가 되면 한국은 파산이다.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짓는게 좋을 것”이라는게 통화의 요지였다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증언한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후 학계 일각을 중심으로 “한국 외환위기는 미국의 음모에 말려든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부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보다도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었다.
음모론의 실체를 확인할 길은 아직 요원하다. 하지만 한국 외환위기의 수습 과정에서 미국이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 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당시 미국 정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실례로 금융기관 외채만기 협상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정부 대표단의 노력도 주효했지만 이에 앞서 미국 정부 내부의 역학관계 변화가 협상 타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게 정설이다.
97년 12월19일. 워싱턴 백악관.
클린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가 열렸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등이 둘러 앉았다. 이날 회의의 의제는 한국의 외채 만기연장 문제였다.
루빈 재무장관은 시장논리를 들어 한국 채권의 만기연장 문제는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상황을 이끌어온 미국 재무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반론이 제기됐다. 코언 국방장관이었다.
“한국은 수만명의 미군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총을 겨누고 있는 나라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풀어가야 한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도 코언 장관을 거들고 나섰다.
이날 회의의 결과는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조기에 재개하고, 은행들의 외채 연장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한국을 옭죄어 왔던 경제문제가 안보논리로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이 회의 이후 미국 은행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호의적으로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외채 만기협상은 순탄하게 타결됐다.
◇ 위기 극복도 '빨리빨리'
외환위기는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한국 경제의 고질병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였다. 정경유착, 금융부실, 차입경영, 부패관행, 족벌경영 등 우리 경제의 취약점들이 통제불가능한 수준까지 한꺼번에 노출된 결과가 바로 외환대란이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 만으로 외환위기가 발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 하더라도 따져보면 수십가지 요인이 동시에 잘못돼 사고가 발생했음을 발견하곤 한다. 97년 외환위기가 바로 그런 경우다. 누적된 병인과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당시 정부가 사태를 좀 더 냉철히 파악했다면, 좀 더 빨리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졌고, 사상 초유의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조기퇴직, 사오정, 노숙자 등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했다.
위기속에서 한국인들의 저력은 빛을 발했다. 장롱속에 묻어 두었던 금붙이를 찾아내 나라 살리는데 써달라며 너도나도 긴 줄을 섰다. 세계가 경이의 눈으로 한국의 위기수습 과정을 지켜봤다.
결과는 놀라움이었다. 한국을 압축하는 ‘빨라빨리’의 의미를 설명이라도 하듯 위기극복 과정 역시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97년 당시 바닥을 드러냈던 외환보유고는 불과 3년새 다시 1000억달러를 넘어섰고, 97년 82억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는 2000년말 100억달러 이상 흑자로 돌아섰다. IMF에서 빌려온 빚도 4년이 안돼 모두 갚아버렸다.
당시 구제금융 협상을 통해 IMF로 부터 차입한 자금은 보충준비자금 134억달러와 크레딧트란셰 자금 61억달러 등 모두 195억달러였다. 97년 12월 55억달러가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99년 5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입금됐다. 2004년 5월까지 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었다.
한국은 이 자금을 당초 계획 보다 무려 2년9개월이나 앞당겨 2001년 8월 전액 조기상환 해버렸다.
보충준비자금은 2000년 6월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8년 12월 첫 상환을 시작해 9개월만인 99년 9월 모두 갚아 버렸고, 크레딧트란셰도 2001년 8월 전액 상환했다. IMF 자금을 빌려 쓴 다른 동남아나 중남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경이적인 성과였다.
하지만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며,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모두 개선됐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위기 수습의 마무리 사령탑을 맡아 2000년 8월 재정경제부 장관에 취임한 진념 전 부총리는 취임 직후 ‘CRIC’라는 표현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CRIC란 “위기도래(Crisis) → 경제주체의 대응(Response) → 상황 개선(Improvement) → 위기를 잊는 자만감(Complacency) → 다시 위기 도래”의 머리 글자를 딴 것으로, “위기를 잊는 자만심이 결국 다시 위기를 부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는 이런 위기를 맞지 말자는 정책 책임자로서의 다짐과 충고가 배어 있다.
97년 외환위기는 한국에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미래를 위해 배워야 할 교훈 또한 적지 않이 남겼다.
위기가 단지 위기로만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