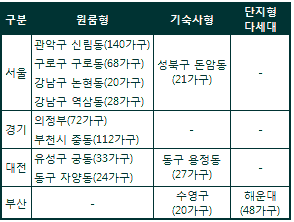역세권 주변에 적당한 입지가 드물고 땅값 상승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개인(땅주인)이나 중소사업자들이 주택 건설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대도시는 사업 문의도 뜸해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
27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까지 13곳, 633가구만 사업승인을 받았다.
연간 1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모두 5곳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2곳(관악구 신림동·성북구 돈암동)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곳도 8곳에 불과했다. 성북구 석관동(28가구·기숙사형)과 영등포구 당산동(80가구·원룸형), 마포구 마포동(91가구·원룸형), 구로구 신도림동(142가구·원룸형), 구로구 온수동(100가구·단지형 다세대), 강남구 논현동(25가구·원룸형), 강서구 화곡동(50가구·단지형 다세대), 양천구 신정동(34가구·원룸형) 등이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경기 2곳, 대전 4곳, 부산 2곳 등이 사업승인을 받아 일부는 준공해 분양에 나서고 있다. 유형별로는 원룸형이 497가구로 가장 많다. 기숙사형은 88가구, 단지형 다세대는 48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실적은 당초 국토부가 예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은 지난해 9월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토부가 올 1월 초 도심지 역세권에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키로 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당시 국토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모두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년에 1만2000가구씩 짓겠다는 얘기다.
|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업지 물색은 물론 준공 후 분양 단계에서도 메리트가 없다며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에 회의적이다. 땅값 상승과 맞물려 수요층, 임대수익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에 인센티브까지 줬지만 수익성 검토 후 사업자들이 손을 놓고 있다"며 "이는 결국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품 면에서 볼 때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원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서울은 적당한 입지를 찾기도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분양을 앞둔 관악구 신림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은 예상분양가가 3.3㎡당 1000만원 선에 달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지나치게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규제완화 발표 이후 문의가 늘고 있는 만큼 내년 4~5월쯤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비록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수익을 낼만한 경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