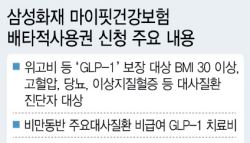|
[노컷뉴스 제공] 분홍빛 환한 색상의 샌들 한 짝. 현실에서 접해보지 못한 샌들이다. 이렇게 화려한 색상의 샌들은 소비자가 부담스러워 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그래서 만들어내지 않은 모양이다. 그러나 강렬한 색상을 입은, 마틴의 작품 속 ‘샌들’은 실제 샌들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다른 한편으로는 촌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 70년대 시골 장터에서 보던 원색 고무 슬리퍼를 연상케 한다. 그 때 보았던 노랑, 연두, 보라, 빨강 슬리퍼에 대한 향수를 자극한다. 어렸을 적 내가 살던 마을에 한 할머니가 시골 5일 시장에서 슬리퍼를 사면 늘 짝짝이로 사온다. 그래서 “슬리퍼를 사려면, OO댁이 최고!”라는 돌림노래가 유행했던 적이 있다.
영국의 개념미술 화가 마이클 크레이그-마틴(Michael Craig-Martin)은 일상의 물건들을 소재로 한다. “의자, 전구, 신발, 커피포트, 유리잔, 소화기, 수갑 등등...” 그는 몇 개의 단순한 선과 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해 일상의 흔한 물건들을 특별하고 매력적인 대상으로 바꾸어 놓는다. 관객은 현실에서 접하지 못한 새로움과 진기함을 느끼게 된다. 일종의 ‘비틀기’와 ‘낯설게 하기’이다. 팝 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이 자신의 작품 ‘마를린 먼로’, ‘코카콜라’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향락주의와 소비지상주의를 일깨웠던 것처럼.
|
마틴은 의자나 신발과 같은 일상적 물건이 마를린 먼로보다 더 유명하다고 여긴다. 그는 이러한 평범한 물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이어 “이런 물건을 그리는 선들이 작가의 우아하고, 시적이고, 복잡한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개념미술은 맥락적인 이해를 관객에게 요구한다. 작품 속 ‘샌들’, ‘물통’, ‘의자’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물음을 던진다. 일상에 존재하는, 대량 생산된 이들 물건들과 작품 속 사물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름과 형태는 같지만 작품 속 이미지는 새롭고, 확장된 의미로 재해석된다. 물통, 의자, 샌들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됨으로써 하나의 소모품일 뿐 그것의 존재가치는 중요시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면서도 하찮게 여겨지는 물건들. 이들 물건들이 마틴의 작품 속에 색다른 이미지로 다뤄짐으로써 '하찮은 것’에서 ‘소중한 것’으로 뒤집어진다.
|
제 1세대 영국 개념미술의 대표주자 마틴(1941년생)의 개인전이 서울 청담동 피케엠 트리니티 갤러리에서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평면화 20점과 대형 벽화 1점이 소개된다.
마틴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나 미국 예일대학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후 1960년경부터 유럽에서 활동했으며,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 교수로 재임하며 데미안 허스트를 비롯한 ‘영국의 젊은 예술가 그룹’의 작가들을 지도함으로써 영국현대미술의 비약적 발전에 기여했다.
그의 70년대 대표작 ‘참나무(An Oak Tree)'는 갤러리 벽면에 사물 자체에 우선하는 작가의 의도로 선언한 텍스트와 함께 물이 담긴 1개의 유리잔을 올려놓은 선반을 설치한 것으로 영국 개념미술의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람문의:02) 515 9496-7.
▶ 관련기사 ◀
☞너무나 생생한, 순간의 느낌 … ‘이모셔널 드로잉’전
☞1억년 전 ''공룡''이 화성서 깨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