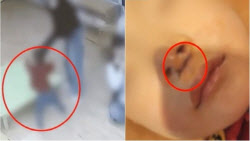1 도적처럼 아바나행 밤비행기를 타다
카리브해의 흑진주 쿠바, 하고도 아바나. 치명적 중독성을 가진 도시. 살사 리듬과 혁명의 구호가 타악기와 랩처럼 공존하는 땅. 해풍에 삭아 내린 페인트조차 표현주의 회화의 화폭으로 전이되는 곳. 하루에 열두 번 바뀌는 카리브의 물빛. 해 저무는 기나긴 방파제, 말레콘. 웃통을 벗은 사내아이들이 마른 등을 보이며 푸른 파도 속으로 몸을 날리는 대양의 끝. 원색 패널의 집과 나부끼는 색색의 남루한 빨래에서조차 치유할 수 없는 낙천성을 내뿜는 골목들. 독한 럼과 시가냄새와 체 게바라의 흑백사진과 영혼을 움켜쥐는 반도네온 소리가 뒤엉킨 몽환의 도시. …그리고 무엇보다 부에나비스타소셜클럽.
 | |
| ▲ 하루에 열두 번씩 변한다는 카리브의 물빛과 아이들. | |
아바나는 이상하게도 내게 예술적 영감뿐 아니라 성적 환상의 이미지로도 떠오르고 있었다. 저항할 수 없는 우수의 매력남 체 게바라, 그 원조 마초에서부터 헤밍웨이, 말론 브랜도, 카스트로, 무라카미 류에 이르기까지 동서의 내로라하는 거친 사내들이 아바나 용광로로 모여들어 흐물흐물 녹아 내렸기 때문일까. 아니면 잘록한 허리 아래로 숨 막히게 확장되는 엉덩이를 가진 뮬라토 여인들의 그 비현실적인 육체의 굴곡 때문일까.
2 밤하늘로 솟아오르는 비행기는 나를 흥분시킨다
출발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비행기 옆자리는 스페인계 혼혈의 청년. 검은 셔츠의 단추 두 개를 풀어 헤치고 있다. 게다가 이 더위에 꼭 끼는 가죽바지란. 빡빡 밀어 버린 머리카락을 길러 묶으면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동생쯤으로 보이겠다. 성적 카리스마 넘치는 사내 곁에서 문약(文弱)한 내 남성은 십분 주눅이 들어 버린다. 비행기는 출발시간이 지났는데 꿈쩍도 않고, 무료해진 청년은 내게 말을 붙여 보고 싶어하는 눈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의 영어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스페인 식의 ‘R’자가 도드라지는 발음에다 생뚱맞게 ‘아리가토’라니. 도무지 의사소통이 어렵자 그는 하얀 이를 드러내고 씩 웃어주고는 신문을 집어 든다. 풀어놓은 윗단추 사이로 털이 부스스하다. 청년의 그런 모습이 일순 나를 동하게 한다. 오해 없기를. 먹 찍고 붓 세워 한 호흡에 그리고 싶다는 말이다.
짙은 어둠 속에서 초록과 빨강으로 고양이 눈처럼 빛을 뿜는 활주로의 불빛을 천천히 감아 돌던 비행기가 돌연 엄청난 힘으로 솟구쳐 오른다. 오오. 익숙해서 나른한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아바나행 밤 비행기의 굉음과 속도여. 음지식물처럼 갇힌 남성성을 사정없이 유린하는 그 단순 무지막지한 힘이여.
눈을 감고 그제야 등받이에 나를 내려놓는다.
3 꽃들에게 내 슬픔을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낯선 도시에 도착해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한 안색의 사람들과 입국절차를 기다리고 있노라면 매번 속이 울렁거린다. 더위와 피로, 낯선 숙식과 스케줄에 대한 불안감에 살짝 체한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이다.
 | |
| ▲ 원색의 화려한 의상과 시가가 어울리는 쿠바의 여인들. | |
어둑신한 호세마르티 공항은 소도시 버스대합실처럼 한산하다. 계급장 없는 허름한 군복을 입은 직원은 내 여권을 한참 동안이나 뒤적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스탬프를 꽝 찍어 준다. 하염없이 기다려 짐을 찾아 나오는데 구석의 흐릿한 불빛 아래 젊은 남녀가 부둥켜안고 거칠게 입맞춤을 하고 있다. 푸르스름한 형광등 빛 때문일까. 열기보다는 허기가 느껴진다. 벽 위 낡은 액자 속에서 군복 입은 카스트로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사랑은 때로 이데올로기보다 더 사람을 허기지게 하는가. 문을 나서니 알도가 손을 번쩍 든다. 훌쩍 큰 키에 선량한 눈빛의 마흔아홉 살 쿠바 남자다. 김일성 대학에 유학하여 공부한 적이 있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거기서 익힌 한국어를 다섯 살짜리 소년만큼 구사한다. 그래서 그의 한국어는 어순이 잘 안 맞는 데다 북한식과 남한식의 표현이 뒤섞여 기묘한 느낌을 준다. 일테면 이런 식. “두 개의 한국말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이 잘 조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말 잘 조직되지 못해도 실례합니다. 며칠간 잘 소명하겠습니다.”
차는 희미한 불빛으로도 확연히 드러나는 가난과 남루의 거리를 지난다. 그 무너져 내릴 듯한 집들이 신경이 쓰였던지 그는 굳이 몸을 돌려 쳐다보며 힘주어 말한다. “쿠바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 잘 안됩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거지도 없습니다. 쿠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 행복합니다.” 우리나라 TV에서 가끔 본, 독특한 평양 억양과 표정마저 섞여 있다.
나는 조바심을 내며 부에나비스타소셜클럽의 공연에 대해 묻는다. 공연을 볼 수 있겠느냐고, 꼭 봐야 한다고. 하지만 그의 반응은 뜻밖에 차갑다. “선생님도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아바나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외국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없습니다. 그런 정도는 쿠바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
차에서 내리니 후끈한 무더위와 끈끈한 살사 음악이 살갗으로 스며든다. 아아, 쿠바에 왔다. 이브라힘과 오마라의 목소리에 홀려서.
글라디올러스와 흰 백합….
꽃들에게 내 슬픔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내 눈물을 보면 꽃들이 죽을 테니까.
부에나비스타소셜클럽 (Buena Vista Social Club)
쿠바의 대표적인 아프로 쿠반 재즈그룹. 주로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적인 쿠바음악 붐을 일으키며 수백만 장의 음반판매고를 올렸다. 1997년 그래미상을 받았으며 독일 영화감독 W 벤더스에 의해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져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다.

■ 김병종 교수는…
2000~2001년 조선일보에 연재됐던 인기 시리즈 ‘김병종의 화첩기행’의 작가 김병종(53) 서울대 미대 교수가 ‘라틴화첩기행’으로 5년 만에 다시 독자들을 만난다. 그는 ‘바보예수’ ‘생명의 노래’ 그림 시리즈로 유명한 동양화가로, 순수예술을 이어가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는 보기 드문 작가다. 또 평론·희곡·수필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글을 발표해, 소설가인 아내 정미경씨와 글발을 견주는 ‘문인 화가’이기도 하다. 5년 전 ‘화첩기행’에서 그는 전국을 답사하며 이 땅에 피고 진 각 분야 예술인들의 흔적을 찾았다. 올해 그는 남미의 강렬한 색채와 정열, 리듬을 따라가는 여행을 했다. 그의 여행기는 미술뿐 아니라 문학, 음악, 영화, 무용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전반을 넘나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