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지요. 이야기에는 연극 외에도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어요. 극작가라는 것은 연극의 요소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죠. 소설은 당연히 언어를 통한 이야기지만 연극은 거기에 배우, 공간, 시간까지 고려되어야 해요.
요즘의 이야기는 드라마라든지, 기승전결로 이루어진 구조로 협소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야기라는 말보다는 내러티브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내러티브 한다는 말은 기승전결 구조가 아니어도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미술적인 이야기도, 음악적인 이야기도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부모님들이 흔히 그러시잖아요. 대학만 가면 “너 마음대로 해” 라고. 그렇게 해서 대학에 왔는데 실상은 별 게 없더라고요. 미팅도 한 두 번 나가봤는데 거기서 거기였고요. 우연히 연극반 들어가니까 세상과는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다행히 연극반 선배님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연극을 만들게 됐어요. <한씨 연대기>에 한영덕 역으로 출연하면서 처음 연극과 만났지요.
그때는 연극을 계속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일상 생활이 뭔가 빤해 보이고 이러다가 직장 잡고 이러다가 결혼하고 이러다 나중에 장례식장 가겠지. 이런 식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였는데 연극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식으로 세계랑 만났어요. 그것이 내 인생이 될 거라고는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혼자서 연극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찾아 보니까 극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희곡을 써서 쓰게 되었고 다행히 처음 쓴 것이 공연도 되고 평가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나에게 그런 재주가 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작품을 무슨 연금술 대하듯이 대하면 안돼요.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일상과 가깝게 지내야 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쓰는 거에요. 평상시 메모들이 모여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인터뷰 장소에 오다가 공사장 앞에서 물 뿌리는 아저씨를 만났어요. 나는 그 아저씨의 오만한 표정이 인상 깊었어요. 그런 인상들을 받았으면 메모를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씩 정리를 또 해요. 그렇게 평상시에 정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작품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묵히면 진짜 써야 될 게 남아요.

'연극은 세계의 또 다른 면을 보게 해주는 창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연극을 하는 것은 '내가 본 세계의 또 다른 면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지, 연극이라는 창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보고 싶은 세계가 동그라면 동그랗게 만들고요. 그게 네모난 창을 필요로 하면 네모나게 만들어요. 모양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창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창 자체에 시선이 가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진 창은 창 너머에 있는 것이 같이 보이거든요. 창이 못 만들어져서 그 연극이 같이 나누고 싶은 세계보다 연극의 만듦새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듦새는 창 만드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지, 관객이랑 나누고 싶은 가장 큰 목표는 세계의 다른 면을 함께 보는 것이죠.
 연극 <햇빛샤워>
연극 <햇빛샤워> 
내가 본 세계의 다른 면이 그냥 나만의 세계였다고 판단될 때는 완전히 좌절해요. 희열을 느낄 때는 앞에 이야기 한 것과 같이 말해서 내가 본 세계의 다른 면이 관객이랑 같이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최근에 무대에 올렸던 <햇빛샤워> 때 그랬는데 관객들과 그 세계를 같이 보고 있다. 같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을 필요가 있구나’, ‘계속 연극을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럴 때는 정말 행복해요. 온 극장이 하나로 묶이는 순간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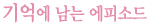
배우들이랑 보냈던 시간들이 기억에 항상 남아요. 엄청 힘들게 연습을 하고 밤에 악몽까지 꿔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배우들을 만나도 배우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연극의 최종 언어는 배우죠. 배우로 인해서 결국 연극의 마지막이 완성이 돼요.
연습하면서 원래 대사를 자주 바꾸는 편인데, 배우들도 종종 대사를 바꾸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가 오히려 더 좋은 대사 나오기도 해요. 작년 <햇빛샤워> 낭독 공연 때 광자가 동교에서 브래지어를 주면서 하는 말을 “포 유”라고 바꿨어요. 그런데 지난 남산 공연에서 “고객님, 포 유”가 된 거에요. 광자 역의 김정민 배우가 바꾼 거지요. 처음에는 상황과 너무 딱 들어 맞아서 대사가 바뀐 줄도 몰랐어요. 이건 애드리브가 아니에요. 배우의 연기도 연기지만 작품을 파악하는 통찰력에서 나오는 거에요.


일단 처음으로 무엇보다 극작을 하려면 연극에 대한 공부, 이 세계에 대한 공부를 극작술을 공부하는 비중만큼 해야 돼요. 이 세계에 대한 공부라는 것은 인문, 철학, 문학, 미술, 역사까지 이 정도는 그 전공자들하고 말을 하더라도 통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극작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 창작과 진학한다거나, 학원 다닌다거나, 책을 사 본다거나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주 부분적인 것의 하나라는 거에요. 극작은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본 세계를 표현하는 것일 뿐인데, 그 세계가 없으면 극작술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에요. 칼을 가지면 무엇을 할거에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너무 보여지는 것에만 급급하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해요. 세계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사유하는 힘을 길러야 해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 연극의 문장은 소설이나 시의 언어처럼 절대적으로 가슴에 탁하고 꽂히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관계의 궤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희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터득하면 희곡을 쓸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극작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에요. 관객의 이야기를 듣고,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잘 들으려면 귀를 잘 열어놓고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해요. 자기가 낮아져야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리고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극작가는 사람을 좋아해야 해요.
정리: 강진이 기자(매거진 플레이디비 jini21@interpark.com)
사진: 플레이디비DB, 서울문화재단, 김솔 포스터 디자이너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