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퇴 선언을 한 문재인 대선 후보는 대표로서 마지막 악수를 기자단에 건넸다. “그간 고생했다” 등 상투적 인사는 없었다. 별다른 말 없이 기자들 손을 한번씩 꼭 쥐고 대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이 때까지만 해도 문 후보는 위기의 남자였다. 당 안팎에서 사퇴 목소리가 높았고 당은 분당이 한창이었다. 호남 지역의 의원들은 하나둘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세력의 규합을 도모하고 있었다.
사퇴를 공표하고 8일 후인 27일 문 후보는 당대표직을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에게 넘기고 평당원의 신분으로 돌아갔다. 2015년 2월8일 당대표로 당선된 지 354일, 1년을 채우지 못한 시점이었다.
문 후보가 당대표에서 물러난 27일은 제20대 총선을 불과 두달 반 가량 남겨둔 시점이었다. 평당원이긴 했지만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서 거센 도전이 예고됐던 셈이다.
사퇴 기자회견이 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정권교체 희망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겸허하게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인정하지 않겠나”라는 말로 책임을 떠안았다. 4·13 총선의 결과에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건 셈이다. 목표는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 저지였다. 내심 180석까지 내다보고 있던 당시 새누리당의 기세를 고려하면 배수진을 친 것이다.
호남 지역 의원들의 탈당으로 비토 정서가 높았던 호남에서도 의외의 약속을 했다.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에서 은퇴하고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광주 충장로를 찾은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을 만큼 예상 못한 시점에서 뜻밖의 발표였다. 자신을 향한 호남 민심을 확인하고자 했던 정면돌파의 포석이었다.
첫 번째 위기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 1당으로 올라서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됐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의 선전으로 123석을 확보, 새누리당 112석으로 밀어내면서 문 후보의 은퇴는 연기됐다.
그러나 두 번째 약속이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호남 28석 중 단 3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호남의 차가운 민심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23석을 확보한 국민의당이 호남 맹주가 됐다. ‘호남 지지’ 발언은 이후에도 문 후보를 공격하는 빌미가 됐다.
호남의 재신임(?)을 확인하는 데는 1년 1개월이 걸렸다. 대선 후보를 내세운 원내 정당만 다섯 당, 5자 대결로 진행된 제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는 호남 표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며 호남의 마음을 되찾았다. 대구·경북·경남을 제외하고 전국적 지지를 확인했다.
2017년 5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출구조사에서 압도적인 당선 가능성을 확신한 문 후보가 오후 8시 33분께 대회의실에 도착했다. 사퇴 회견을 남기고 떠난 지 468일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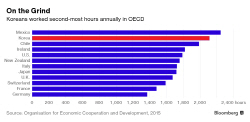



![친누나 11차례 찔러 죽이려한 10대에...법원 “기회 주겠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27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