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호텔인 롯데호텔은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서울 소공동 이그제큐티브 타워(신관)의 문을 닫는 방안을 검토했다. 평소 50~60% 수준이던 객실 점유율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10% 남짓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신관 객실이 총 278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20개실 안팎만 예약이 된 셈이다.
지난 2018년 1년의 공사 끝에 ‘6성급’을 지향하는 고급 호텔로 재개장하면서 높아진 객실 단가와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하는 상황 등이 맞물린 결과다. 다만 8일 이후에도 소수의 예약 고객이 있는 만큼 실제로 문을 닫지는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롯데호텔뿐만이 아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동에 위치한 주요 호텔들의 객실 점유율은 20~40%대에 머물고 있다.
코로나19 초반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3~4성급 호텔의 타격이 컸다. 이후에도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국내 고객들 역시 호텔 예약 취소에 나서고 있다.
|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이나 제주도 서귀포시 WE호텔 등 확진자가 방문한 호텔은 방역을 위한 휴점만으로도 손해를 봤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보다 높은 전염성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역시 오래갈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이 본격화한 6~7월 국내 호텔 객실 점유율은 80%에서 40%대로 급감한 바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메르스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으로 타격을 입었던 소비재 중 회복 기간이 가장 길었던 업종은 호텔·레저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호텔업은 방문 몇 달 전부터 예약이 이뤄지는 만큼 타격을 받으면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며 “향후 실적 정상화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라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놔버린 곳도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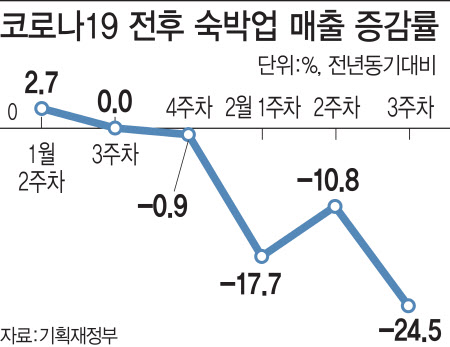




!['약물운전' 포르쉐 운전자 공범 구속...늘어나는 의료용 마약류 범죄[사사건건]](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400272t.jpg)
![이 스웨이드 세트 어디 거?...'173㎝ 모델핏' 미야오 가원 공항룩[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40018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