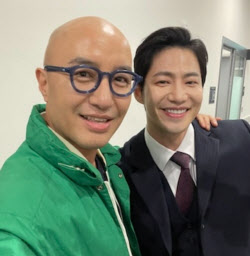[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22년 대학로 연극인생에 종지부를 찍으려 합니다. 전 실패했지만 부디 힘내십시오.”
최근 곽최산 우리네극장 극장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직접 쓰고 연출한 작품의 저작권까지 팔아 6년간 극단을 운영해왔지만 바뀌지 않은 제작 현실에 비관해 스스로 대학로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21일에는 90억 원의 부채를 이기지 못해 공연제작자 최진 아시아브릿지컨텐츠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극열전’을 기획·제작한 극단 적도의 홍기유 대표도 비슷한 이유로 지난해 세상을 등졌다. 대학로 주변에서 폐업과 자살 소식이 끊이질 않자 무력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공연계에 몸담은 개인이나 집단은 모두 잠재적인 회생파산 대상자라는 말까지 나온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명확하다. 시장은 정체한 반면 공급은 늘었다. 실제 국내 뮤지컬 시장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업계 추산 지난해 무대에 오른 뮤지컬 수는 2500여편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런데 규모는 수년째 3000억대에 머물러 있다.
제작사의 빈인빈 부익부도 심각하다. 수익을 내는 작품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관객을 모으려면 스타를 출연시켜야 하고, 그로 인해 제작비가 껑충 뛰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변했다는 게 공연계 중론이다. 제작자는 투자금으로 이전 작품의 손실을 메우는 ‘돌려막기’를 택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진다. 연달아 작품이 실패하면 출연료 미지급 사태나 공연취소 및 제작중단, 파산으로 이어지고,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만 남게 되는 셈이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곳이 공연을 무리하게 계속 올릴 수 있어 이를 막을 만한 제도의 부재도 문제다.
공연예술인의 자살을 개인만의 비극으로 치부해선 안되는 이유다. 다행인 건 공연계 내에서 자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르면 9월 둘째 주께 제작자·배우·스태프 등이 모여 공연계 근본적 변화를 위한 첫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동시에 공적 영역도 작동돼야 한다. 되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공연계 모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민간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몰랐습니다. 알다시피 갖가지 창작 보조금을 지원해 열악한 제작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어요.” 명망있는 제작자의 자살로 공연계가 실의에 빠진 상황에서 적어도 담당 중앙부처의 공무원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