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개봉했던 ‘강남 1970’이란 영화를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극 중 복부인 민마담(김지수)은 당시 논밭이던 강남 지역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꾸밉니다. 그 과정에서 ‘데두리 친다’는 은어가 나오는데요.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매물의 가격을 올리는 과정을 빗대어 쓰는 말입니다. 영화에서는 땅값을 올리기 위해 사고파는 행동을 되풀이하는 ‘손바뀜’을 통해 가격을 올립니다.
최근 웃돈의 중심에 있는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는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이 그 역할을 합니다. 구조는 생각하시는 그대롭니다. 지방 각지를 돌며 단기 시세 차익을 남길만한 분양 시장에 뛰어들어 매물을 확보하고 돈을 얹어 되파는 거죠. 공인중개업소의 말을 종합해보면 떴다방의 자금력은 생각보다 풍부한 편입니다. 돈이 되겠다 싶은 아파트 분양권을 다수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청약 당첨자들의 분양권을 받아 웃돈을 얹어 되팔고 그 차익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건설사나 공인중개업소 입장에서는 떴다방이 싫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분양한 아파트의 가치가 인정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입소문을 타고 퍼지는 홍보 효과도 한몫합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떴다방은 돈이 안되는 분양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위에 떴다방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청약 경쟁률까지 가늠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인중개업소 입장에서도 떴다방이 올린 웃돈이 이후 매매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웃돈의 대가를 실수요자들이 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양가를 가볍게 뛰어넘은 가격을 감내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사야 하나 고민이 많아집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불법 거래를 막아주면 안 될까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계약 현장을 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향기 많은 꽃에 벌과 나비가 많기 마련입니다. 떴다방이 많은 아파트가 장점이 많은 아파트 단지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꽃을 위해 수천만원, 혹은 수억원의 웃돈을 얹어 주는 일은 한 번 더 고민했으면 합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매물이 아닌 권리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하지 말고 주변 시세와 투자 가치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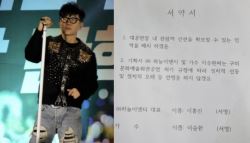

!['7억8000만원' 로또 1등 남편 살해한 여성이 한 말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4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