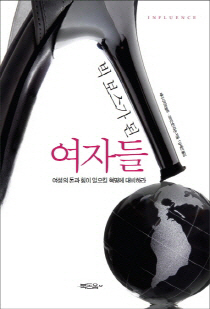|
이 날을 이해하기 위해선 100년을 거슬러야 한다. 1908년 3월 8일 미국 맨해튼에 1만 5000여명 여성이 모였다.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행진을 벌이면서 이들은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우리는 빵과 장미를 원한다.” 빵은 남성 노동자 수준의 임금, 장미는 남성처럼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였다. ‘3·8 여성의 날’의 기원이다. 하지만 미국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1920년이 되어서다.
100년 후 상황은 달라졌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미국 여성은 국가의 사유자산 중 51%를 소유했다. 가정 내 구매 결정권 중 80%를 쥐었고 학사학위 소유자는 58%에 달했다. 경제력을 발판으로 장벽을 부숴간 여성이야기는 미국만의 것이 아니다. 이즈음 여성들은 정치력까지 갖추고 세계무대에 등장한다. 2008년과 2009년에만 아르헨티나·칠레·핀란드·가봉·인도·아일랜드·라이베리아·필리핀에선 여성 대통령이, 독일을 비롯해 방글라데시·아이슬란드·우크라이나 등에선 여성 수상이 선출됐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돈이 정치를 움직이기에 이른 것이다.
미국 인구학자이자 마케팅전문가인 매디 디히트발트와 언론인 크리스틴 라손이 지난 한 세기를 토대로 여성권력이 앞으로 일으키게 될 ‘혁명’을 예견했다. 세계 최초로 여성이 투표권을 얻은 1893년 뉴질랜드를 기점으로, 생존권과 참정권을 위해 투쟁하던 여성들이 경제력을 쥐고 영향력을 휘두른 과정을 100여년 기록으로 짚었다.
필수조건은 경제력에서 찾았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역시, 경제력은 여성이 생존과 독립을 보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추친체다. 다만 경제력이 여성지도자를 배출하고 여성제품 시장을 확대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주목했다. 여성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소비하며, 소통하고 정치하기 때문이란 거다. 이런 이유로 여성이 얻는 힘은 단순히 인권과 평등의 문제를 넘어서 세상 전체를 바꾸는 ‘혁명’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성공이 곧 경제적 부가 아니다”. 저자들이 다루고자 한 궁극적인 성공은 경제적 해방이다.
페미니즘의 관점이 아니란 것을 책은 애써 강조한다. 굳이 그 잣대로 날카롭게 각을 세우지 않아도 여성은 역사에서 사회적 약자였다는 거다. 남성의 규칙이 늘 잘못됐고 여성의 규칙이 늘 정당했다고 우기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다만 여성이 경제력을 무기로 ‘기존’에 도전장을 내는 현실은 계속 주시하라고 이른다. 여성이 갖추는 힘이 종국엔 남녀 모두에게 가장 효율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논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