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민등록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불안감에 떨고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주소열람제한' 조치를 취해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현재 거주 주소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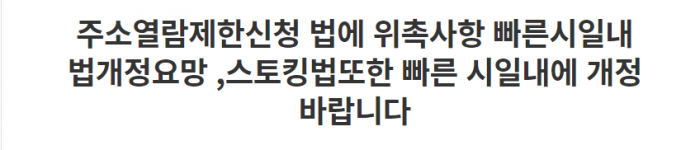
"폭력 피해 주소 열람 제한했지만... 누굴 위한 법인가요"
지난달 23일 국민청원에 ‘주소열람제한신청에 대한 법 개정을 바랍니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한 청원인은 가해자인 남편을 상대로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 제한’을 신청했다. 전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이사를 했어도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남편이 청원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자 얘기가 달라졌다.
가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주소가 ‘불상’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린 것. 민사 소송의 경우 소장을 송달할 장소가 불명확할 경우 소송의 진행이 불가하다. 이때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는다. 설령 원고가 가정폭력의 '가해자'여도 주소보정명령서만 있다면 '피해자'인 피고의 현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
청원인은 “보정명령서가 있으면 주민센터 등에서 주소를 떼어줘야 한다더라”며 “열람제한을 걸어둔 의미가 있는 것인가. 교부기관에서도 주소보정명령과 열람제한이 충돌하는 것을 인지하고 사안을 검토하고는 있다지만 (검토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절망했다”며 하소연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걸어 현 거주 주소를 알아내겠다"며 협박 받는 사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폭력을 피해 주소 열람을 제한했지만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한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주소열람제한’과 ‘보정명령’ 충돌... "정보 노출 우려↑”
법률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29조 6항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토록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법 제29조 2항 2조에 따르면 소송에 필요한 경우 ‘주소보정명령서’가 있으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 등·초본 교부기관장은 제한대상자에게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희 변호사(밝은빛 법률사무소)는 “’아니할 수 있다‘라는 문구 자체가 발급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라며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승미 변호사(법무법인 승원)도 “같은 법 조항 내에서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며 “소송권 역시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판사의 보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주소열람제한권보다 앞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법 소관부처인 행안부는 제도 보완을 검토해가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주민과 관계자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피고(피해자)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가정폭력으로 주소 열람이 제한된 원고(가해자)가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피고의 거주지 등을 알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노출 피해 우려를 위한 세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명호 변호사(법무법인 감사합니다)는 “판사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주소열람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또한 법원이 주소가 불명확한 가정폭력 피해자 대신 등·초본교부기관으로 소장 송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소송권과 주소열람제한권 모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모르는 학생 '수학여행비' 대신 내준 학부모...왜? [따전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1600311t.jpg)

![“일 멈추고 멍 때리세요”…매일 ‘멍시' 주는 이 회사[복지좋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160004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