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절 발탁된 파월 의장 임기는 2022년 2월까지로, 1년 남짓 남았다. 사실 2018년 2월 파월 의장 임기 시작 전까지 40년간 연준 의장직은 연임이 관례였다. 상대 당 대통령이 앉힌 의장이라 해도, 별문제가 없다면 2번의 임기, 즉 8년간 자리를 보장해줬다. 이 전통을 깬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취임 이후 이른바 ‘오바마 흔적 지우기’ 과정에서 전직 옐런 의장을 현 파월 의장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파월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맹활약했다. 사상 처음으로 회사채까지 사들이며 양적완화(QE) 역사의 새 장을 썼다는 평가 속에 미국 여야뿐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월가(街)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헬기처럼 돈을 살포해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붙은 벤 버냉키 전 의장을 능가했다며 파월 의장을 ‘B1 폭격기’에 빗대기도 했다.
지난해 4월 팬데믹 속에 바이든 당선인이 미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자 CNN비즈니스의 폴 R. 라 모니카 칼럼니스트는 공개적으로 “트럼프와 바이든은 파월의 연임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파월의 몸값은 일취월장이었다.
문제는 바이든 당선인이 지금까지 파월 의장에 대한 평가를 자제해왔다는 점이다. 물론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은 데다 트럼프 탄핵정국 속에 △코로나19 △경기침체 △기후변화 △인종차별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들이 즐비한 만큼 의장 인선문제는 후순위로 밀렸을 공산이 크다.
월가에선 ‘연임’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는 분위기다. 그 배경으로는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당시 벤 버냉키 의장을 연임시킨 점, 파월이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프로그램의 설계자로, 그 누구보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 금융시장을 안정시켰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점, 파월 재신임 카드가 상원의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꼽힌다. 파월 의장으로서도 ‘상사 바이든’은 나쁘지 않다. 그는 사사건건 통화정책에 개입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다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선도 있다. ‘자기 사람’을 심어야 한다는 주변의 눈총, ‘백인 남성’ 일색이었던 연준에도 ‘다양성’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압박 등이 파월 의장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옐런 지명자와 막판까지 재무장관직으로 놓고 겨뤘던 여성인 라엘 브레이너드(아래) 연준 이사의 이름이 흘러나온다. 흑인인 로저 퍼거슨 전 교직원퇴직연금기금(TIAA) 최고경영자(CEO)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파월 의장을 연임시키되 2024년 대선 전 교체하는 시나리오도 나돈다. 시장 안정과 파월의 체면을 세워주는 동시에 자신이 지명한 연준 수장을 앉히는 두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2월 누가 연준의장 자리를 꿰차든 작금의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월가는 보고 있다. 파월 의장과 브레이너드 이사는 지난 14일 각각 “금리인상 시기가 아주 가까운 건 아니다” “현 수준의 자산 매입이 상당 기간 적절할 것”이라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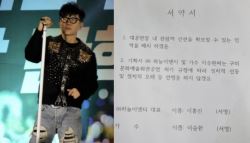

!['7억8000만원' 로또 1등 남편 살해한 여성이 한 말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4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