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최근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한계온도에 주목했다. 인체의 정상 체온은 보통 36.5~37.2도 사이로, 더울 때는 땀을 흘리고 추울 때는 몸을 떨어 체온을 올리는 방식으로 신체의 항상성이 유지된다. 그런데 날씨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특정 온도에서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
네이처는 올리 제이 호주 시드니대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주목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습구온도는 청년층이 26~34도, 고령층은 21~34도 수준이다. 습구온도는 온도와 함께 습도까지 반영한 온도를 뜻한다. 물에 젖은 천으로 감싼 온도계인 습구온도계로 측정한 값이라는 점에서 일반 온도와는 차이가 있다.
연구팀은 연구 과정에서 가로 4m, 세로 5m 크기의 챔버(실험실)을 만들었고, 1분마다 온도를 1도씩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했다. 풍속을 제어하고, 적외선 조명등을 사용해 햇빛을 쐬거나 습도를 미세하게 조정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이 내부에서 운동하고 생활하면서 나온 심박수, 호흡, 체온 등 변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한계온도(습구온도)는 34도로 분석됐다.
이는 앞서 나온 연구 결과를 좀더 정확히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0년 미국 퍼듀대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팀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 35도 습구온도에 6시간 노출되면 숨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연구결과는 실제 사람이 옷을 입거나 땀을 흘릴 수 있는 등 인체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성에 한계를 지적받은 바 있다.
폭염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체 영향 평가와 과학적인 냉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경자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위원(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교수)은 “폭염 자체도 중요하지만 습도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며 “통상 체감온도는 50% 상대 습도를 기준으로 해서 10% 오르면 1도 더 높은 것으로 보는데, 만약 35도 온도에 80%의 습도라면 실제로는 3도가 높은 38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변화 영향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지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는 낮아진다. 서둘러 습기를 제거하거나 바람을 불게 해 수증기를 날려주는 것과 같은 대응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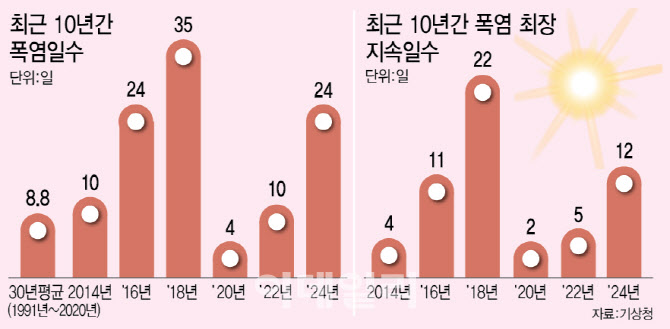


![러시아가 누리호 엔진 줬다?”...왜곡된 쇼츠에 가려진 한국형 발사체의 진실[팩트체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30122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