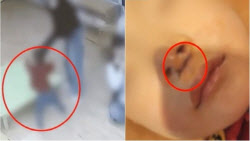[조선일보 제공] 2007년 새해 첫 주말에 개봉하는 임상수(44) 감독의 ‘오래된 정원’은 그동안 터부로 여겨졌던 80년대 운동권의 한 예민한 상처를 건드리고 있다. 황석영 장편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의 외피는 ‘광주의 아들’이었던 현우(지진희)와 도피 중인 그를 숨겨줬던 미술교사 한윤희(염정아)의 멜로 드라마. 하지만 감독은 이데올로기와 조직을 우선하다 개인을 방기(放棄)해버린 당시의 풍경을 예리하게 잡아내면서,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과연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당시 운동권일수록, 이 영화를 불편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선 전제 하나. 80년대 운동권들이 세상을 잘못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의 한국사회가 예전보다 좋아졌다면,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그들이 과도하게 미화되거나 신비화되는 것에 대한 거부가 있을 뿐이다.”
―실제로 정치적 지향에 따라 이 영화를 다양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지난번 시사회가 끝난 뒤, ‘송환’(비전향 장기수의 삶을 다룬 다큐)을 만든 김동원 감독님이 ‘너의 시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 기본적으로 내게 애정이 있으신 분이다. 또 내 영화의 후원자인 79학번 선배 부부가 있다. 당시 운동을 아주 ‘세게’ 하신 분들이지. 그 분들은 가슴에 숨겨뒀던 무언가를 발화(發火)시켜 준 것 같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화두는 ‘화해’고 ‘치유’다.”
―“인생 길어, 역사는 더 길어. 우리 좀 겸손하자. 너 그거 하지 마. 조직인지 지랄인지”(자신의 정파를 대표해서 감옥에 들어가겠다는 운동권 후배에게 윤희가 하는 말) 같은 대사가 어떤 운동권 진영에는 ‘조롱’이나 ‘모욕’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겠다.
“(영화에서 대학을 자퇴하고 노동운동을 하던) 미경이가 분신했을 때, 윤희는 그 아이를 ‘열사’라고 영웅시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무서웠겠니, 얼마나 뜨거웠을까’를 먼저 묻는다. 20대는 아직 어린 나이 아니냐. 대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 아무리 양보해도 이 영화에서 ‘조롱’을 떠올리기는 힘들다.”
―대학(연세대 사회학과 81학번) 시절 당신은 학생 운동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고 들었다.
“전혀 안 했다. 아마 나처럼 안 한 사람도 없을 거다. 덕분에 ‘왕따’였다. 공부는 안 하고 사진이나 찍으면서 연애만 많이 하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고뇌가 많은 시간이었다. 충실한 관찰자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난도 있는 것 같다. 운동에 참여한 적도 없는 사람이 감히, 운운하는.
“네가 뭘 알아,라는 그런 비난? 솔직히 말하면 약간 천박한 반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이야말로) 강력한 우월의식이지. 80년대에도 그랬다. 그때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상처를 알면서도 덮어놓고 있는 것 같다. 스스로는 다룰 엄두를 못 내는 거겠지. 나는 운동권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영화의 함의와 상관없이, 386세대의 후일담이라는 코드가 대중 입장에서는 조금 진부하지 않을까.
“(웃으며) 영화를 본 충무로 사람들 반응이 모두 ‘야, 영화 정말 잘 찍는다’더라. ‘재밌더라’는 얘기는 안 하더만. 딱 까놓고 얘기해서 잘 찍었고, 좋은 영화인데 장사 되겠느냐 이거겠지. 하지만 냉정하게 흥행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렇게 잘 안다면 모두가 떼돈 벌었겠지.”
―작가주의 감독으로서 당신의 자존심과 상업영화 감독으로서의 자본에 대한 책임감은 어떻게 타협하나.
“내가 스케줄 지키는 걸로 유명한 감독이다. 이번 영화도 40회 촬영으로 마쳤다. 칭얼대는 건 꼬마나 하는 짓이지. 영화판은 잔인한 정글이다. 시스템 내부에서 합리적 제작비로 내 뜻을 이해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지.”
―‘처녀들의 저녁식사’ ‘눈물’ ‘바람난 가족’ ‘그때 그 사람들’ 등 예전 작품보다 이번 영화를 보며 당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너그러워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예술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술가 지망생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좀더 래디컬(radical)해질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류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이지. 그런데 40대 중반이 됐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도 주류다. 더 이상 불평불만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결론은.
“냉소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나는 오해라고 생각한다. 또 내가 (영화로 한국의 정치를) 공격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한국사가 그만큼 공격 당할 소지가 많았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공격보다는 우리가 지금 왜 불행한가, 좀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오래된 정원’은 좌냐 우냐, 누구 편이냐의 문제가 아닌, 그런 차원의 고민이다.”
(오래된 정원 예고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