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거부 움직임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국회는 ‘의정활동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항소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여전히 공개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및 수사 등의 국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지출 규모가 지난 10년간 8조 56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국민 세금이 ‘기밀유지’를 이유로 사용 내역을 남기거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눈먼 돈’이라는 사실이다.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는 이유다. 지난 4월 검찰의 ‘돈봉투 만찬사건’에서 오간 것도 특수활동비였다. 그렇다 보니 취지와 달리 허투루 쓰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업무상 횡령이나 다름없는 범죄가 공공연히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80억원 정도 배정돼 상임위원장 등이 나눠 쓰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08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고 밝혀 물의를 빚었다. 신계륜 전 의원은 자녀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역시 지탄을 받았다. 게다가 국회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건 수사를 하는 기관도 아니다. 특수활동비를 쓸 이유가 없다. 무슨 염치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 4007억원에서 17.9%(718억원)나 줄여 편성했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도 각각 22.7%, 20.5% 감액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축의지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정부의 특수활동비 개혁의지가 이러한데 오히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릇된 관행에 젖어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국민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꺼내 쓰는 악습을 뜯어고치는 것은 입법기관이 솔선해야 할 책무다. 국회는 즉각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 한다. 이참에 꼭 필요한 예산은 검증 가능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모두 없애는 게 마땅하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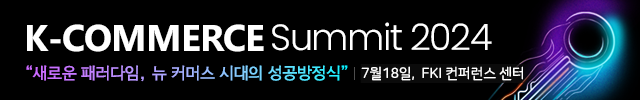
![수십년 전 한강 간척비도 냈다…54년 만에 재건축 '중산시범' 가보니[요이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600282t.jpg)

![금투세 정면충돌…누가 이길까[최훈길의뒷담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600234t.jpg)

![“사고 싶다”…벌써부터 MZ·여심 사로잡은 이 차[이車어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600094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