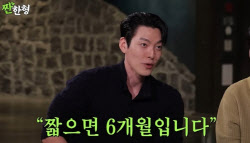주부 김 모씨는 지난 3월 일본 백엔샵에서 사온 지퍼백 매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코로나19 사태 전과 가격은 같았지만 매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백엔샵 같은 곳에서 산 제품들은 가격이 예전과 동일해도 기분 탓인지 양이 줄어든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
◇엔저발 원가 상승에 ‘디플레 상징’ 100엔샵 진열대도 변화
미국과 일본의 높은 금리 차이로 인한 엔저가 지속하면서 ‘100엔숍’ 진열대가 바뀌고 있다. 엔저 장기화로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서 100엔으로 팔 수 없는 품목이 늘게 되자 제품 양을 줄이거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 수백엔대의 상품을 내놓으며 소비자 이탈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이 지난 달 말 단기 정책금리를 16년 여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리면서 관련 기업들이 변화된 경제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적인 100엔숍 중 하나인 캔두는 6월 말 기준 전체 제품 중 비(非)100엔 상품 비중이 1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0엔의 가격은 변함없다’는 전략을 추구하는 100엔숍은 진열한 대부분의 제품을 100엔에 파는 소매점을 뜻한다. 1990년대 ‘거품경제’가 붕괴한 뒤 일본의 심각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현상을 상징하는 매장 중 하나다. 한국에서 유명한 다이소를 포함해 세리아, 캔두 등 일본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100엔샵이 있으며 작년 기준 전체 매장수는 총 89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제는 100엔샵 진열대에서 220엔짜리 플라스틱 바구니, 990엔짜리 IH(인덕션 히팅) 냄비 등 100엔을 훌쩍 넘는 제품을 보는 건 흔한 광경이 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비100엔 제품은 일본 전체 100엔샵 매장 면적 기준으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엔화 가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가 급등한 영향이 컸다. 수입 원자재 값 상승으로 100엔 가격으로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품들이 늘어나자 업체들은 제품 크기를 키워 수백엔대 상품을 내놓거나 반대로 제품 사이즈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한 데 따른 것이다.
|
100엔숍 기업들이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인상이 매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어서다.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4월 이후 2%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임금 상승폭은 물가 상승에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2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탓에 기업들도 선뜻 원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와이 에이지 세리아 사장은 최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소비자는 타당성이 있으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원가 인상)에 편승한 것은 눈치챈다”면서 당분간 원가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00엔샵용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도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치솟는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을 오롯이 반영하지 못하고 가격을 변함 없이 유지하다보니 생산 현장 일선에선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제품 소재를 바꾸거나 300엔샵 등 다른 유통 업체로 판로를 넓히는 식이다.
특히 최근에는 부가가치를 더하는 상품 만들기로 아예 전략을 바꾸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쥐어짜기식 원가 절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가격 인상의 명분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카자하야 타카히로 UBS 증권 선임 애널리스트는 110엔(소비세 10% 포함)이 아닌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심리에 대해 “대기업이 만든 수천엔의 제품을 수백엔에 손에 쥐려는 것과 같다”며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높은 부가가치가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디플레이션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비용 증가 부담을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격 인상의 적정선을 찾고 있다”며 “임금인상 확산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에 필요한 것은 포스트 디플레이션 시기에 맞는 경제 운영”이라고 짚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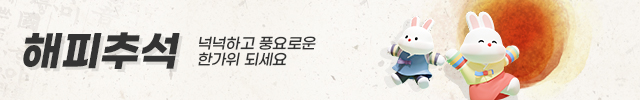


!["어머니! 요새 누가 잡채 만들어요"…MZ 아들딸이 산다는 이것 [먹어보고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1700124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