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의 철학자 막심 로베르(Maxime Rovere)는 스피노자에 관한 자신의 저작에 ‘스피노자와 그의 친구들’이라는 흥미로운 제목을 붙였다. 한 철학자의 삶과 철학을 조망한 책 제목에 ‘친구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스피노자의 사상이 한 개인의 산물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의 결과물이라는 의미다.
이번 시집도 마찬가지다. 책의 곳곳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는 시인의 시 쓰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존재들이며, 이런 점에서 시인의 친구들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김영찬의 시에는 우리가 시라는 말에서 응당 기대하는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가령 그의 시에는 심리적 상처나 그것을 위로하는 목소리가 없다. 그에게 시는 독자를 위로하거나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언어는 감동이나 위로보다는 전쟁, 전투에 가깝다.
‘대중의 취향에 따귀를 때려라’라는 마야코프스키의 말처럼 김영찬의 시는 대중의 기호나 취향을 의도적으로 배반하는 듯하다. 또한 그의 시에는 독자들의 관음적 시선을 만족시킬 내적 고백이나 가족사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이 없다. 개인적 상처나 결핍 따위에 관심이 없으니, 그것들을 승화시키는 카타르시스 장치도 없다.
그의 시는 김소월, 정지용, 서정주, 백석, 기형도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는 한국 시의 계보에 대한 부채가 없다. 대신 그는 유럽적인 것, 또는 그것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비(非)한국적인 것에 친연성(親緣性)을 느낀다.
벨기에 태생의 프랑스 시인 앙리 미쇼는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이 아니라 남아메리카와 아시아 같은 비서구 문화에 관심을 가졌다.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뢰즈는 프루스트의 말을 빌어 “좋은 책들은 외국어로 씌어진다”고 언급했다.
앙리 미쇼의 ‘비서구’, 질 들뢰즈의 ‘외국어’는 위대한 예술이 예술가가 속한 문화적 전통이나 계보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배반을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김영찬의 시 역시 매우 적극적이고, 분명한 방식으로 한국 시의 전통에 대한 무관심을 표현한다. 오히려 그의 시는 초현실주의와 더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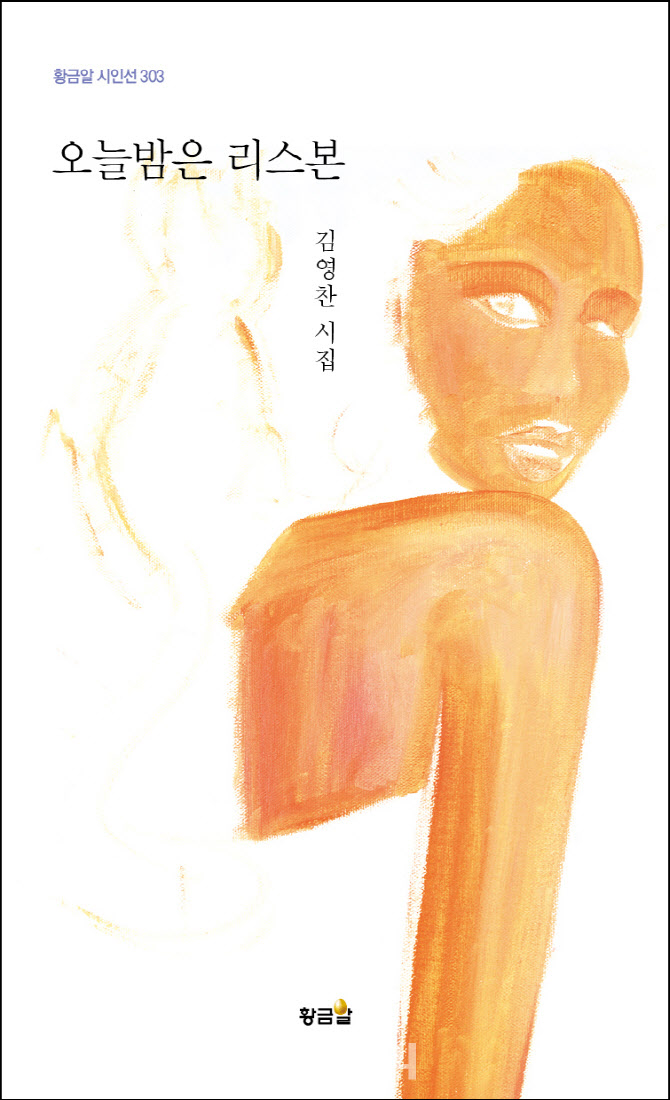




![“덩치 큰 남성 지나갈 땐”…아파트 불 지른 뒤 주민 ‘칼부림' 악몽[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