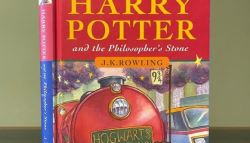40여년 전 디스코 열풍 때가 대표적이다. 1970년대 중반 필라델피아와 뉴욕을 중심으로 등장한 디스코는 펑크(funk)와 소울, 팝, 살사 등 다양한 장르의 요소를 결합해 빠르고 경쾌한 리듬감을 강조했다. 1977년 존 트라볼타 주연의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Saturday Night Fever)가 세계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유행하는 음악에는 돈이 따랐다. 더 비 지스, 보니 엠, 도나 서머, 빌리지 피플 등은 디스코 음악으로 막대한 음반 판매고를 올렸다.
그동안 ‘록의 시대’를 이끌며 인기를 누리던 록 뮤지션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만 있지 않았다. 데이빗 보위가 ‘John I′m Only Dancing (Again)’(1975)을 발표하고, 엘튼 존이 키키 디와 함께 ‘Don′t Go Breaking My Heart’(1976)를 부른 것이 대표적이다.
밴드들도 디스코 열풍에 편승했다. 롤링 스톤즈는 ‘Miss You’(1978)를 작곡했고, 비틀즈의 폴 매카트니는 ‘Goodnight Tonight’(1979)이라는 디스코 풍의 곡을 선보였다.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 핑크 플로이드는 디스코 요소를 반영한 ‘Another Brick in the Wall, Part 2’(1979)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심지어 악마적인 분장을 한 키스마저 ‘I Was Made For Lovin′ You’(1979)를 내놓았다.
|
록과 디스코의 전쟁은 1979년 7월 12일 밤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날 록 음악 방송국 DJ들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홈구장인 코미스키 파크에서 ‘디스코 파괴의 밤’(Disco Demolition Night)이라는 이벤트를 열었다. 주최측은 야구 경기 중간에 디스코 음반을 모아놓고 폭약으로 폭파해 버렸다. 흥분한 관중들이 경기장에 난입해 파괴 행동을 이어갔고, 결국 경찰이 진압하면서 사태는 종료됐다.
1980년대 초반 들어 디스코 열기는 급격하게 식었다. 록 마니아들의 공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실 디스코 열풍의 배경에는 경제 여건의 변화가 있었다. 1970년대 중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현실 도피를 하려는 대중이 빠르고 경쾌한 디스코 음악에 빠져들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당초 디스코의 인기 배경이 됐던 ‘현실 도피’가 더이상 필요 없어진 셈이다.
정치·사회적인 배경도 있었다. 디스코는 동성애자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1980년 미국에서 보수 진영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디스코가 설 자리를 잃었다는 분석도 있다.
|


!["또 눈 온다"…영하 추위에 꽁꽁 언 도로, 출근길 '빨간불'[오늘날씨]](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2900038t.jpg)

!["성관계 요구 알려질까"…십년지기 숨지게 한 일가족[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2900003t.jpg)
![[단독]SNS 성범죄 증거 삭제 막는다…'불법 영상물 보전명령 도입'](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29001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