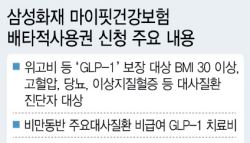[이데일리 연예스포츠부 고규대 부장] 포켓몬GO의 열풍은 마치 아이폰이 국내에서 상륙할 때의 분위기를 떠올린다. 정식발매에 앞서 미국에서 아이폰을 사와 국내 전파인증을 통해 사용한 이들도 있었다. 지난 6일 해외서 첫 출시된 포켓몬GO의 국내 정식 출시에 앞서 한번 해보겠다며 강원도 속초를 찾은 이들도 아이폰 얼리어답터와 닮았다. GPS 기반 게임임에도 국내 지도의 해외 반출이 안돼 포켓몬GO의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됐다는 오해도 터져 나왔다.
그 즈음 또 하나의 게임이 출시됐다.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가 모바일게임 회사와 공동 개발한 ‘EXORUN(엑소런)’이다. 7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이어 14일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오픈,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출시했다. 엑소의 멤버 중 하나를 선택해 달리고 뛰고 나는 이른바 ‘Run’게임이다. 쿠키런 등 기존 런게임과 거의 흡사하다. 엑소를 론칭할 당시 가상으로 설정했던 각 멤버 고유의 특징을 게임 속 캐릭터에 담은 게 특징이다.
포켓몬GO의 흥행과 엑소런의 출시는 IP(Intellectual Property·지적재산)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한다. 포켓몬GO을 분석하는 이들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이 나온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결국 전세계 팬을 확보한 포켓몬 콘텐츠의 인기와 맞물렸다고 분석한다. 엑소런 역시 아시아권에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K팝 그룹 엑소라는 콘텐츠에 바탕을 둔 게임이다. 런게임 최초로 코스튬 시스템을 탑재, 의상부터 신발, 액세서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다고 프로모션한 것도 엑소 팬들의 지갑을 노린 전략적 선택이다. EXO는 태양계 외행성을 뜻하는 ‘exoplanet’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름으로, ‘미지의 세계에서 온 새로운 스타’라는 의미를 담아 각 캐릭터마다 고유의 특징을 갖는 게 특징이다.
지적재산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라도 반향은 사뭇 다르다. 포켓몬과 엑소를 동일선상에 놓긴 어렵다. 엑소런은 출시한 지 열흘이 지나 10만 다운로드(구글 스토어 기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에서 정식 출시도 안된 포켓몬 GO를 설치해 한국에서 이용한 사람은 100만명을 돌파했다.
앞서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CT)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향후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설계했다. 콘텐츠 기업에서 콘텐츠 기반 테크놀로지 회사로 진화한다는 게 이 회장의 의지다. SM엔터테인먼트를 매니지먼트 기업, 가요 기획사로 국한하기보다 IT 기업에 가깝게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미 10여 년전부터 지적재산을 기반으로 한 게임 등에도 눈을 돌렸지만 게임으로 성공한 작품을 찾기 어렵다. 아시아권 팬덤을 대상으로 한 관심사 기반의 SNS 서비스 Vyrl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이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소설 ‘반지의 제왕’는 판타지 분야의 신기원을 이룬 데 힘입어 온갖 게임에 영향을 미쳤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게임 ‘워크래프트’에 탑재되면서 마법사, 오크 등 캐릭터도 되살아났고 이후 출시된 수많은 게임에 모티브를 줬다. 엑소런이 절반의 성공에 머문 이유도 여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반지의 제왕’의 세계관이 판타지 소설 마니아의 시선을 넘어선 것처럼 엑소의 콘텐츠 역시 팬덤만의 영역을 넘어서야 한다. 엑소런의 캐릭터 이미지를 닌텐도의 게임 mii 닮은꼴로 만들었다는 오해를 받기보다 차라리 보편적 정서를 가진 게임 이미지를 만드는 게 나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이수만 회장의 CT에 대한 열정, 나아가 창조경제를 꿈꾸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전문가의 노력은 응원을 받을만하다. 지적재산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재산을 통한 게임 등 IT 분야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고민했다. 다행히 그 답은 알고 있다. 다만 그 답만을 향해 뛰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포켓몬GO가 포켓몬 마니아만의 게임을 넘어서 일반인에게 확장된 이유는 보편적 호기심을 자극한 덕분이다. CT를 꿈꾸는 우리도, 팬덤에 머무는 데서 벗어나 보편적 확장이 찾아야할 때다. 엑소든 ‘태양의 후예’든 나아가 터닝메카드든 팬덤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 모든 이를 만날 채비를 해야 한다.
[데스크칼럼] 포켓몬GO에서 배우는 콘텐츠 확장성
`포켓몬 고` 열풍
- 잡은 '포켓몬'만 145종…익스피디아, 닉존슨 후원 - 하이소닉 '포켓몬고 고향' 일본 진출…교토사무소 개소 - 다날, 포켓몬고 결제업체 뱅고와 전세계 결제시장 본격 진출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