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통화에 대해 본격 규제에 나섰다. 최근 투기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가상통화가 정식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그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도 재확인했다.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폐해는 전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가상통화 투기가 이미 보편화됐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뒷북 규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비트코인으로 시중에 첫선을 보인 가상통화는 투기 버블을 일으키며 우리 주변에 깊이 침투한 상태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인터넷상에서 문을 열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자체도 그렇지만 어떤 날에는 거래대금이 코스닥 시장의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가상통화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소비자보호 조항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따르는 것도 당연하다. 검찰에 의해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사건’이 단적인 사례다. 가상화폐 암호를 풀어주는 미국의 고성능 채굴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2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끌어들인 사건이다. 피해자만 해도 전국적으로 6000명 안팎에 이른다니,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비슷한 폐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속아 넘어간 각 개인에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조짐에도 팔짱을 끼고 있던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가상화폐가 이렇게 관심을 끄는 것은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소문났기 때문이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데다 순식간에 가치가 요동치기 때문에 기회를 잘 잡기만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독성이 강해 도박처럼 변질되기 쉽다는 게 문제다. 더구나 거래에 몫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직장인들은 물론 대학생들도 줄줄이 뛰어들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단속에 나선 만큼 사회적인 부작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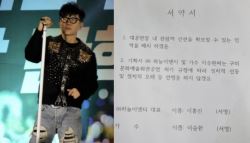

!['7억8000만원' 로또 1등 남편 살해한 여성이 한 말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4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