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최저임금 제도의 경직적 운영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업종이나 기업에 상관없이 모든 부문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음식업이나 노동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이나 모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생산성 격차가 큰 대기업과 소기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도 동일하다.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문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이 다르다. 호주는 업종별 기업별로, 영국은 연령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적용한다.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자국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해 최저임금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업종별 기업별 생산성 격차가 상당히 큰 양극화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격차가 최고 수준인 나라다. 서비스업 내에서도 생산성 격차가 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생활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심각하게 낮다. 영업잉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업종이 있을 정도다.
대기업과 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도 OECD 평균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는 취약기업 비중이 30%를 넘을 정도로 기업 간 양극화가 심각하다. 이런 현실 아래서 모든 부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너무 가혹하다.
그런 연유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에도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백히 규정돼 있다. 법의 취지를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
|
현행 최저임금 제도 운영의 두 번째 문제점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 결여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대개 이렇게 진행돼왔다.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 위원 간의 첨예한 대립과 소모적 갈등으로 타협점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정부의 의중을 반영하는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이 대안 부재로 채택되면서 끝난다.
위원 구성상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 위원이 자신들의 안을 관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정부의 의중을 반영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꼴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한 것도 이런 결정구조 하에서 가능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입김에 의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인 것이다. 그래서는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는 나름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실질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을 뺀 값으로 정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예측 가능성 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객관성을 보장받기는 어렵다. 이 공식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의 변수가 통째로 배제되어 있다. 최저임금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그 공식을 부득이 수용한다 하더라도 언제 어느 정부가 들어서 이런 기준을 뒤엎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금보다는 더 정교한 최저임금 결정 준칙을 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준칙 하에 일정 범위 안에서 사용자대표와 노동자대표 간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 정부는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온 만큼 이제 좀 더 성숙하고 합리적인 제도 설계와 운영을 할 때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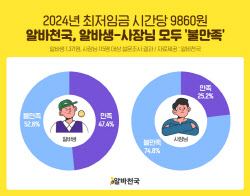


![“덩치 큰 남성 지나갈 땐”…아파트 불 지른 뒤 주민 ‘칼부림' 악몽[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