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벨기에는 유럽 중심부에 있는 대표적인 강소국이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도 단단하게 입지를 다졌다. 벨기에는 세계 10위권의 교역량을 자랑하는 곳으로 맥주와 와플, 아이스크림, 초콜릿으로도 유명하다. 우리에게는 정치와 경제, 문화, 복지가 균형 잡힌 곳으로 알려져있다. 유럽연합(EU) 본부가 있어 유럽의 수도로 불린다.
이런 벨기에가 요즘 테러리스트의 온상이 됐다. 물론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벨기에가 유럽 교통의 요지이면서 경찰력도 상대적으로 엉성해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기 좋은 무대가 됐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아름다운 유럽의 수도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온 아랍계 이민자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탓이 크다.
벨기에 인구는 1100만명 정도다. 이 가운데 무슬림은 50만명 정도다. 문제는 이들이 기존 사회 구성원과 전혀 섞이지 못하고 차별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벨기에는 본토 출신과 이민자의 실업률 차이가 유럽 내에서도 가장 큰 곳으로 알려졌다. 아랍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브뤼셀의 몰렌베이크는 실업률이 무려 30%에 달한다. 이쯤 되면 벨기에 이슬람 이민자의 아들딸들은 사회적 불만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파리 테러 용의자 살라 압데슬람이 체포된 이 도시는 벨기에 정부도 관리를 못해 손을 놓은 실정이다. 이민자 2세들이 이슬람 급진사상에 빠져들 좋은 토양을 갖춘 셈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파리테러를 이끈 압델하미드 아바우드, 지난 18일 체포된 압데슬람은 벨기에 출신이다. 벨기에의 인구 대비 지하드(이슬람 성전) 참전 비율은 1백만명당 40명이다. 이는 프랑스의 2배, 영국이나 독일의 4배 수준이다. 벨기에는 유럽국가들 가운데 시리아에서 전투경험이 있는 극단주의 외국인 전투요원(500명)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이기도 하다.
프랑스나 벨기에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를 발본색원하겠다며 강경 대응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벨기에 주류에서 소외된 이슬람 이민자 후손을 이대로 둔다면 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가 발호할 좋은 토양을 제공하는 셈이 된다. 아무리 눈을 켜고 막으려 해도 제2의 파리테러나 브뤼셀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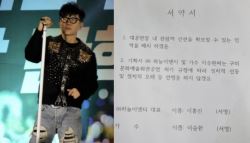

!['7억8000만원' 로또 1등 남편 살해한 여성이 한 말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4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