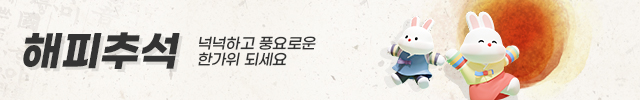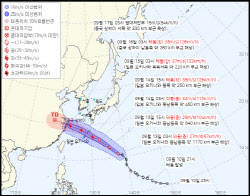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주말 산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을 2개로 정리했다고 한다. 1안은 현행 9%와 40%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50%로 둘 다 올리는 방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어느 방안을 선택해도 연금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5년에서 7~8년 늦춰질 뿐이라는 데 있다. 이 정도의 방안을 개혁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이번 숙의단 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안보다 내용상 후퇴했다.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이번 숙의단 1안과 같은 내용의 ‘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각각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7년과 16년 늦추는 안이다. 이에 비해 숙의단 1안과 2안은 그 시점을 각각 7년과 8년 늦출 뿐이다. 그렇더라도 연금기금 고갈이 2060년대에나 닥칠 일이라고 자위해선 안 된다. 그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계속 살아 있어야 하니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또 다시 큰 폭으로 보험요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투입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운영을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연금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다. 기금 고갈을 몇 년 더 늦추는 미봉은 개혁의 비용만 눈덩이처럼 키워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도 그래서다. 기납입 보험료로 운영되는 구연금은 일찌감치 국고 지원에 나서고 향후 납입 보험료로 운영되는 신연금은 엄격하게 낸 만큼만 받도록 해 고갈 우려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자는 것이다.
KDI의 제안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 국민적 합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 문제의식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한시도 놓아서는 안 될 화두다.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개혁안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찔끔찔끔 고갈을 늦추는 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더 떨어뜨릴 뿐이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