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어쩌다 보니 무너지고 말았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었는데.” 눈물까지 글썽인 이 인터뷰는 노키아 전 CEO 스티븐 엘롭 편이었다. 세계 휴대폰시장 선두주자였지만 2013년 결국 회사를 매각했다. 엘롭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겠다”며 인간적인 고백도 흘렸다.
비슷한 경우가 하나 더 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큰 서점체인이던 보더스의 전 CEO 마이크 에드워즈. 2011년 도산신고를 하면서 그는 “겸손을 배웠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랜기간 사회생활에서 배운 지식·경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맞다. 두 기업은 ‘디지털 쓰나미’에 직격탄을 맞고 ‘사망했다’. 굳이 전문용어를 붙이자면 ‘디지털 디스럽션’의 희생물이었던 거다. 디지털을 타고 온, 기존 산업구조를 뒤흔들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파괴적 혁신. 그런데 이들의 실패에 교묘하게 맞물린 다른 기업이 보인다. 노키아 앞엔 삼성의 승승장구가 있었고, 보더스 위엔 아마존의 파죽지세가 있었다. 그렇다면 노키아와 보더스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삼성이고 아마존인가. 대기업 삼성의 기술·자본력, 신생기업 아마존의 아이디어에 밀려 결국 노키아와 보더스가 운명을 다한 건가.
흔히들 그렇게 믿어온 ‘바로 그거지. 뭐가 더 있겠어’란 가설.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이가 있다. 시장파괴의 주범은 기술도 자본도, 아이디어도 아닌 ‘소비자’라는 거다. 디지털마케팅 전략과 전자상거래 분야 전문가인 저자의 주장이 그렇다. 그는 “별 기술도 없어 보이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등 신흥강자가 시장판도를 뒤바꾸는 방식에 공통패턴이 있더라”고 운을 뗐는데. 지난 8년간 수백 개의 대기업·신흥기업을 찾아다닌 끝에 내린 결론이 그렇단다. 그러곤 ‘디커플링’(decoupling)이란 키워드를 꺼낸다. ‘끊어내기·분리하기·해체하기’란 뜻이다. 소비자의 주요 활동인 탐색·평가·구매·사용 중 약한 고리를 끊고 들어가 그 지점을 장악하는 방식. 그것이 이제껏 상상하지 못한 공룡기업을 만들어낸 핵심이란 거다.
|
이미 25년 전쯤 세상에 나온 ‘파괴적 혁신이론’에 살을 붙였다. 당시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리더가 자신의 일을 혁신으로 포장하기 위해 ‘파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더랬다. 그런데 이 개념이 이상하게 변질하는 현상을 저자가 포착한 거다. 작은 기업이 기존 기업에 도전해 성공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했던 그것이, 어느 순간 기존 기업의 면피용이 돼버린 현상. 그러고나니 새로운 변수가 하나 보이더란다. ‘소비자’다. 시장파괴가 벌어지는 출발점이 기술도, 신생기업도 아닌 소비자였다는 거다.
에어비앤비는 그중 저자가 공들여 살핀 사례다. 사실 대단한 시작은 아니었다. 첨단기술이 필요한가, 엄청난 자본이 드나. 누군가 소유한 땅이나 집, 아니면 방을 하루단위로 ‘공유·임대’하는 시스템이니까. 그러니 세상에 널린 숙박시설들이 눈이나 깜짝 했겠는가.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다. 슬금슬금 회원은 늘어가는데, 색다른 광고도 특이한 마케팅도 안 보이고.
그제야 위기를 감지한 것은 호텔업계. 그중 한 곳이 포시즌스호텔이었나 보다. 저자가 발 빠른 취재력을 동원해 만나본 마케팅담당이 저자의 입맛에 딱 떨어지는 발언을 해준 듯하다. “에어비앤비가 등장하기도 전부터 감지해온 어떤 트렌드가 있다”는 것. 2000년 초반부터 파리를 두 번 이상 방문한 소비자가 동네 민박 같은 숙박시설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다. 거실과 다이닝룸을 갖춘 구조 말이다. 이 변화에 호텔업계가 대응을 안 했던 것도 아닌 듯하다. 2000년대 후반 포시즌스호텔만 해도 콘도를 모방한, 침실 몇개와 거실·주방까지 딸린 스위트룸을 만들기 시작했다는데. 그런데 과연 해결책이 됐을까. 콘도식 스위트룸이야 어디까지나 초상류층을 위한 거였고. 게다가 소비자가 굳이 호텔을 마다한 진짜 이유까진 감도 잡지 못했다는 거 아닌가. 침실 이상의 가족공간을, 잠자는 것 이상의 현지생활을 엿볼 공간을 원했던 ‘소비자의 변화’ 말이다.
에어비앤비는 간파했고 포시즌스호텔은 덜 간파했던 것. 결국 플랫폼을 개설한 지 10년 안팎, 에어비앤비의 시장가치는 310억달러(약 36조 3400억원)를 찍었다. 2018년 통계로 190개국 300만명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다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호텔체인인 메리어트의 3배 규모다.
핵심은 에어비앤비가 포시즌스호텔을 무너뜨리겠다고 덤빈 적이 없다는 거다. 에어비앤비뿐인가. 삼성은 노키아를 파괴하지 않았고, 애플은 코닥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며, 다이슨은 필립스에 흠집을 내지 않았다는 점을 저자는 누누이 강조한다. 변한 건 소비자였고. 한 가지 토를 더 달자면 느슨하게 대처한 조직문화였고.
△기술·자본으로 시장 누르기는 이젠 안 먹혀
물론 소비자 마음을 읽어낸 디커플링 역시 작동 중이었다. 가령 비디오 대여 체인 1위였던 블록버스터가 2013년 파산한 건 넷플릭스의 출현과 확실히 연결되니까. 넷플릭스가 비디오를 시청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왔던 소비자 활동을 끊어냈으니까. ‘한 번 해볼까’ 했던 순수한 소비자 행동을 자극해 종국엔 시장을 무너뜨렸으니까.
이 과정에서 저자는 중요한 함의 하나를 더 빼낸다. 전통기업의 CEO나 임원이 좋아하는 결론이 얼마나 단순한가 하는. 그들 대부분은 어쩌다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신생기업이 시장을 망가뜨렸다고 믿는다는 거다. “잘 돌아가는 시장을 왜 휘저어놓지?” 그러니 해결책 역시 단순해질 수밖에. 신생기업을 따라하거나 인수해버리거나 가격으로 장난을 쳐 질식하게 만드는.
대안 또한 디커플링. 그런 면에서 저자의 디커플링은 이중적이다. 기업의 실패를 만드는 것도, 성공을 만드는 것도 끊어내기에 달렸다고 하니. 물론 그 칼자루는 어디까지나 소비자가 쥐고 있다. 그러니 끊임없이 살펴야 할밖에. 그들의 사고방식·생활패턴을 축으로 ‘소비자 가치사슬’을 해체하는 것만이 기업의 살 길이 될 테니. 다만 디지털과 소비자가 결합한 ‘접점’은 주시하란다. 디지털 디스럽션에 올라탄 소비자가 현재로썬 가장 막강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더 이상 소비자의 고민이 A마트로 갈까, B마트로 갈까가 아니란 뜻이다. 새벽 배송 장바구니에 뭘 담을까로 확대한 욕구를 읽지 못한다면 뻔한 엔딩이란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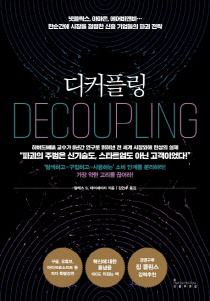






![결혼 앞둔 예비신부 사망…성폭행 뒤 살해한 그놈 정체는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2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