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의 Y부동산 관계자는 “올 들어 계약서를 한 건도 못 썼다”고 한숨을 토해냈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 열풍이 몰아쳤던 춘천에는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은 속칭 ‘깡통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작년 말 입주한 A단지는 6개월째 절반쯤 비어 있다. 분양가보다 1000만~2000만원쯤 싸게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
정부가 강남 버블 붕괴를 우려하는 사이에 지방 부동산 시장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토지는 거래가 스톱됐고, 아파트도 살 사람이 없다. 원래 수요 기반이 취약했던 지방에 정부·지자체의 개발 계획 남발로 가수요만 촉발시켰기 때문이라는 게 지역 전문가들의 분석. 한 컨설팅 회사 대표는 “지방 시장의 급격한 붕괴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연착륙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 부동산, “누가 살 사람 없나요?”=정부의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지방에선 부동산을 살 사람이 사라졌다. 신규 분양아파트는 계약률이 20~30%를 넘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는 입주 시작 1개월이 넘었지만, 입주율은 불과 10%선. 30평대는 분양가보다 2000만원 낮은 헐값에도 살 사람이 없다.
토지시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기업도시로 지정된 전북 무주군 안성면. 당시 투기 열풍이 분 탓에 평당 3만~4만원이던 논밭이 평당 15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끊겼다. 한 중개업자는 “6개월째 거래가 없어 가격을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해 충남도청이 이전하기로 확정 발표한 충남 홍성군 홍북면 일대. 평당 25만~26만원까지 치솟았던 논밭 가격이 최근에 17만~18만원대로 30% 이상 급락했다. ‘서해부동산’ 이두영 사장은 “이젠 급매를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발을 구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공급 과잉 더 심각해질 듯=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4~2005년 수도권에서 착공한 주택 수는 36만4161가구. 하지만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지방에서는 이보다 20만가구 많은 56만3280가구가 공급됐다. 지난 2~3년간 착공한 주택들이 올해부터 입주를 본격화한다.
행정중심도시에 인접한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G, D, S, W 등 건설업체의 분양 모델하우스가 한꺼번에 4개나 들어서 3000여 가구를 분양 중이다. 중개업자 박모(45)씨는 “조치원읍 전체 가구가 1만3000가구에 불과한데, 2~3년 내에 분양물량이 1만가구를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다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6곳), 혁신도시(10곳), 행정중심도시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수십만 가구의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일부에선 건설업체가 땅값 상승을 빌미로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여 스스로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박사는 “자칫 지방에 ‘제2의 IMF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심각한 과잉 공급 상태”라고 말했다.
◆주민들 “세금만 늘었다”=작년 말 혁신도시로 선정된 충북 음성·진천군. 혁신도시 개발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두성리 등에는 ‘혁신도시 결사 반대’같은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있다. 조치원 ‘M공인’ 정모 사장은 “보상금으로 대체농지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토지가 수용되지 않는 주민들도 속을 끓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한 주민은 “거래가 되지 않아 재산세만 늘게 생겼다”고 했다. 기업도시·혁신도시를 만들어야 할 지방자치단체도 호가가 치솟아 보상비 마련에 난감한 판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지난 2~3년간 지방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은 게 주택건설이었다”며 “주택시장이 붕괴되면 지방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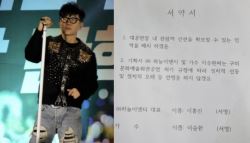

!['7억8000만원' 로또 1등 남편 살해한 여성이 한 말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4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