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길호 금융부장] 개혁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의식과 제도의 틀을 동시에 바꾸는 혁신전쟁이다. 겉으로 드러난 하드웨어 뿐 아니라 내면적인 소프트웨어까지 변하도록 유인· 압박· 강제하는 과정. 그래서 단순한 선언적 구호로는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목표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의식과 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될때 개혁의 동력은 힘을 받는다.
금융개혁의 메시지가 전방위로 울려 퍼진다. ‘통렬한 반성, 강력한 규제 혁파, 낡은 관행의 개선…’ 금융당국의 언어는 비장하고 강렬하다. 온·오프라인 장벽의 파괴, IT를 접목한 금융서비스의 등장, 금융업권의 융·복합화. 금융생태계의 지각변동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물결이 출렁인다. 정권초만해도 집권세력으로부터 홀대 받는다는 지적을 받던 금융부문이 이젠 4대 국정개혁과제의 한 자리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금융개혁은 역대 정권의 단골 레퍼토리다. 정부가 금융자율화· 규제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1990년대 이후 지속된 핵심 정책과제다. 하이라이트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정부의 구조개혁. 고도압축성장기 부실과 관치로 얼룩진 금융부문에 메스를 들이대는 파격이었다. 대마불사의 신화는 사라지고 은행은 문을 닫았으며 보험· 증권· 종금 전 금융권이 영업정지나 합병 등으로 다시 태어났다.
폭풍처럼 진행된 바로 그 개혁작업은 그러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으론 이어지지 않았다. 하드웨어는 변했지만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금융부문의 질적 경쟁력은 답보상태다. 구태를 답습하는 관행과 의식이 여전히 팽배하기 때문이다. 정권의 눈치만 바라보는 정치금융, 시장 플레이어들의 상전 노릇 하려는 관치금융, 여기에 자생력을 잃어버린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이 모두 삼위일체가 되어 후진성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구조개혁 이후 노무현정부(동북아 금융허브), 이명박정부(녹색금융) 모두 금융부문의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한결같이 요란한 구호에 변죽만 울리다 미로를 헤매며 사라졌다. 금융부문 그 자체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성찰 보다는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한 결과다. 동북아 균형자론, 녹색성장 같은 정권의 레테르에 금융부문을 교묘히 집어 넣어 정치적 슬로건으로 전용했을 뿐이다.
박근혜정부도 이미 이 같은 오도(誤導)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른다. 창조경제의 아류인 창조금융을 구호로 내세우더니 지금은 기술금융을 혁신의 이정표로 삼는다. 통상적인 벤처기업 대출을 기술금융으로 포장해 대출실적에 따라 혁신성 평가라는 이름으로 은행들을 줄세우는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윗분’의 말씀 한 마디에 금융당국과 업계의 리더 108명을 한 자리에 끌어모은 급조된 관제토론회는 전시행정의 극치로 보인다. 대통령이 선호하는 말의 성찬 속에 앞에선 창조 금융, 뒤에선 찍어누르기식 관치 금융이 횡행하는 모습, 바로 한국 금융의 슬픈 자화상이다.
금융은 전형적인 규제산업이다.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해당 금융산업의 명암이 갈린다. 그래서 규칙을 만드는 정부, 심판자 역할을 하는 당국의 관행과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금융산업의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금융개혁은 결국 금융당국의 혁신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헤묵은 규제완화도 낙하산 인사의 척결도 혁신으로 무장한 금융당국의 의지가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뼛속 깊숙이 박혀 있는 관치의 DNA를 제거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금융개혁이란 단순한 정치적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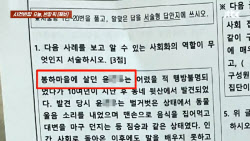
![‘10월 26일 尹 서거' 말한 남성, 인요한에 전화한 이유[사사건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280023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