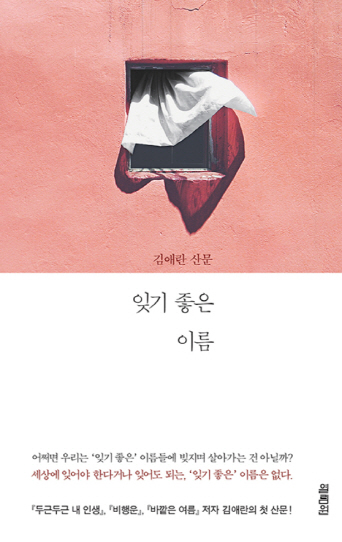|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번에는 ‘두근두근 내 인생’의 김애란(39) 작가가 이름을 불러주었다. 억척스럽게 손칼국수를 팔던 엄마부터 친한 동료 작가, 세월호로 잊혀져간 이름까지. 최근 출간한 산문집 ‘잊기 좋은 이름’(열림원)에는 ‘나’에서 ‘너’, 그리고 ‘우리’로 확장되는 총 37편의 산문이 실려있다. 그간 발표했던 산문을 모은 것으로 유년시절과 성장 환경, 사회적 참사 등을 겪으며 느꼈던 ‘인간 김애란’의 감정을 소소하게 적어 놓았다.
22살이란 어린 나이에 데뷔한 이후 ‘달려라 아비’ ‘바깥은 여름’ ‘두근두근 내 인생’ 등 발표하는 소설마다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이번 책은 중견 소설가로 자리잡은 그녀가 등단 17년만에 내놓은 산문집이다. 최근 이데일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김 작가는 “그간 소설로 여러 이야기를 들려줬으니 이제는 ‘문장 바깥의 문장’을 전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 산문집을 내게 됐다”며 “산문집을 묶으며 나를 지나간 여러 이름과 다시 만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와 너의 이야기…“나를 키운 팔할, 어머니”
‘맛나당’은 김 작가의 어머니가 20년 넘게 손칼국수를 판 가게다. 하루에 밀가루 두 포대 반을 개어본 적도 있다는 어머니는 그렇게 번 돈으로 세 딸을 가르치고, 생활을 꾸렸다. 김 작가는 8년간 재래식 화장실과 삼익피아노가 공존하는 집에 살았고, 훗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칼자국’과 ‘도도한 생활’ 등의 단편을 썼다고 한다. 이 일화의 제목은 ‘나를 키운 팔할’이다. 그는 고3 여름방학때 사범대학에 가라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몰래 예술학교 시험을 보는데, 자신을 키운 팔 할의 기대를 배반한 작은 이 할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한다.
“신문이나 잡지에 산문이 실릴때마다 부모님께서 전화로 이런저런 소감을 전하셨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활자화되는 걸 신기해하셨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늘 신문에 내 이름이 나오는 걸 더 기뻐하신다. 만일 작가가 자신의 몸을 통해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내놓는 존재라면 어머니는 내게 그 몸을 주신 분이다. 그 몸 안에 내 유년의 정서와 유머, 성격, 단점을 모두 넣어주셨다.”
피식 웃음을 짓게 만드는 일화들이 여럿 나온다. 부모님이 처음 만난 일화가 그렇다. 1977년 충남 서산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부모님은 ‘뽕(화투)’을 치다가 눈이 맞았다고 한다. 숙맥 같은 아버지가 6개월 만에 만취 상태에서 ‘나 김정래란 사람을 한번 믿어보시유.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유’란 고백을 한 후 속엣것을 다 토해내는 모습이 안쓰러워 마음을 받아주기로 결심했단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땐 느이 아부지 안됐단 생각만 했지 지금도 이렇게 술을 마셔대면 나중엔 얼마나 더 쳐먹을까 하는 생각은 미처 못 했다. 내가.”
막역한 사이인 편혜영 작가와의 일화도 재밌다. 그녀의 첫번 째 책 ‘아오이가든’이 나왔을 때 이 책의 장점을 돌아가며 열 개씩 말해보자고 제안하는 그녀를 두고 ‘이상한 여자다. 피하자’고 생각했단다. 김연수, 윤성희 작가 등 존경하는 선배들의 이야기도 등장한다.
“세 분 모두 오래 전 그 글들을 기쁘게 읽어주신 기억이 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존중하는 거리와 조심스러움이 필요한 법인데 작가들은 대체로 그런 균형감각을 갖고 있다. 동시에 철없는 내가 자주 보인 틈과 실수에도 너그러워 그 틈 사이로 다정이 깃들게 해주신 데 감사드린다.”
△차기작 장편소설 준비 중
그가 기억하는 세월호 참사의 단면이다. 임시분향소에 직접 찾아갔던 그날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작가도 한 사회의 시민인지라 이런 일에 영향을 받는다. 나는 여전히 내 소설이 ‘계몽’보다는 ‘유혹’이 되길 바란다. 하지만 어느 시절에는 그 시기에만 할 수밖에 없는, 해야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작가마다 그 요구에 호응하는 정치적·미적 방식은 다를 수 있다.”
2011년 발표한 ‘두근두근 내 인생’ 이후 오랜만에 장편소설을 준비 중이다. 어떤 소설일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김 작가는 “소재는 조금씩 다를지언정 ‘시간’은 작가의 영원한 테마가 아닌가 싶다”며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상상했거나 짐작했던 시간을 이제는 몸으로 직접 겪어가며 여러 이야기들로 변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