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진짜 부자들은 샤넬을 좋아해요. 리설주도 샤넬 좋아하던데요. 내 아내는 가방, 화장품, 잠옷까지 샤넬이죠. 짝퉁 아니에요. 시내에는 없는 명품이 없어요. 의외로 루이비통은 적지만.” 이뿐인가. 신발은 나이키·휠라·미즈노, 선글라스는 구찌란다. 화장품은 샤넬이 단연 톱이지만 가성비 좋은 시세이도도 잘 팔린다고 했다. 식료품으론 일본 자바카레를 좋아하는데 돈이 없으면 한국산 오뚜기카레도 괜찮고. 라면도 일본산을 최고로 치는데 한국산 쇠고기맛라면, 맵시면, 신라면도 즐겨 먹는단다.
이 정도면 그냥 상류층쯤 될 듯하다. 그들조차 움찔할 0.01%의 금수저·돈주(신흥자본가)도 있다니까. 금수저 사는 방식은 또 어떤가. 주말이면 ‘재포’(재일교포)가 운영하는 외국인전용시설을 찾는다는데 친구 셋과 1000유로(약 130만원)로 새벽까지 ‘빛낼’(즐길) 수 있단다. 15~30유로 하는 러시아보드카가 있지만, 50유로짜리 산토리 올드나 스카치를 즐기고. 맥주는 하이네켄이다. 한 병에 3유로쯤 한단다. 취기가 오르면 당구 한 판. 시간당 7유로다.
자, 여기는 어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엿보기조차 어려웠던 곳, ‘평양’이다. 외피는 철저히 사회주의지만 속은 끓어오르는 자본주의를 여기저기 터트리는 중이다. 누구도 들추려 하지 않던 그 속살을 들춰낸 이는 김일성종합대 출신으로 2002년 탈북, 국내 한 언론사에서 일하는 북한전문기자다. 금수저·과소비·명품·부동산 등 지금 평양이 내걸고 있는 그림을 한장 한장 펼쳐낸다. 왜 굳이? “평양에서 꿈틀대는 엄청난 욕망이 어떤 배경과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알아야 해서”라고 했다. 그래야 북한의 앞날이 보일 테니까. 책은 평양시민이 드러낸 바로 그 ‘배경’이고 ‘힘’인 셈이다. ‘평양시민 스스로가 작성한 평양심층보고서’면서, ‘평양시민이 남조선 인민에게 던진 평양사용설명서’라고 했다.
사실 저자의 직접적인 표현수위는 이보다 높다. 거리에 아직 붙어 있는 간판 ‘혁명의 수도’가 완전히 빛을 잃었다고 하니. “이제 평양은 부자가 되려는 꿈이 지배하는 ‘욕망의 수도’일 뿐이다. 혁명도 통제도 순응도 모두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썼다.
|
저자가 자신감을 뿜어내는 건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 평양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인터뷰는 물론, 최근까지 살다 온 탈북 청년들의 증언을 풀어냈다고 밝혔다. 여기에 북한 한 엘리트에게서 최종감수까지 받았다고 하니 말이다.
그렇게 철저히 검증했다는 ‘평양 자본주의’를 좀더 들여다보자. 이번엔 주택이다. “요즘 평양에 짓는 아파트는 거의 200㎡(약 60평)이 넘는 대형평수죠. 위치에 따라 30만달러(약 3억 4200만원)도 하지만 10만달러는 다 넘어요. 안 팔리는 거 못 봤어요.” 공급 방식은 이렇다. 부자들이 초기에 투자해 월세도 놓고 전세도 놓고. 은행대출만 아니라면 ‘남조선’과 다를 게 없는 시장인 거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요즘 심상치 않은 모양이다. 재건축바람과 투기열풍 때문이다. 재건축은 1950년대 지은 60년 넘은 평양시내 중심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번졌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서 돈 좀 있는 부자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었다는 거다. 새 아파트는 보통 분양으로 공급하는데 중앙당이나 권력기관을 끼고 있는 건설업주의 돈벌이 수단이 된다. 2000년대 5000달러(약 569만원)에서 시작한 아파트가격이 올해 30만달러를 찍었다니. 2013년 류경동에 완공한 30층짜리 아파트가 그 정도에 거래된다는 얘기다. 5년 전 8만달러에 살 수 있던 거란다. 게다가 투기를 부채질하는 허점도 보인다. 아파트를 거래할 때 다주택 소유자의 매입을 문제 삼지 않는 당국이다. 결과적으로 웃돈을 얹어 되파는 자본주의 거래를 허용한 거다.
상황이 이러하니 북한의 사회문제 역시 ‘부익부 빈익빈’. 려명거리에 70층 초고층아파트까지 등장했다지만 평양의 주택난은 여전히 심각한가 보다. 많은 주민이 석탄이나 김치 등을 공동보관하던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살림집에 전·월세로 들어가 살고 있단다. 지하 창고방이라면 햇빛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 월 20~30달러, 50~100달러가 매겨진다고 했다.
△‘사회주의→시장경제’ 아닌 ‘갈라파고스식 진화’
저자가 유독 주목하는 세대가 있다.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나 김정은시대의 개막을 함께한 이들. 저자는 그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부른다. 장마당은 자본주의식 대형마트. 신라면부터 벤츠까지 갖추고 거대하게 진화한 자유시장이다. 다시 말해 북한주민이 생계를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는 북한식 시장경제의 일선이란 말이다. 그곳에서 자란 장마당 세대는 유학생이 되려 애쓰며 큰돈이 들어도 해외파견직을 선호한다. ‘컴퓨터교육실’ ‘정보봉사소’란 간판을 단 PC방에서 즐기는 게임 한판도 빼놓을 수 없다. ‘콜 오브 듀티’ ‘카운터 스트라이크’ ‘007게임’ 등. 죄다 미군이 주인공이다.
북한체제, 그중 평양사회가 급격하게 시장경제로 가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 다만 그 방식이 독특하다는 거다. 예전 소련·동유럽처럼 사회주의 붕괴 후 시장경제로 전환하던 모양만 들이대선 곤란하단 얘기다. 그렇다고 중국·베트남처럼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방식도 아니란다. 저자는 북한만의 특별한 형태를 ‘갈라파고스식 진화’라고 말한다. 자신들을 표준으로 내세워 세계와 분리된 고립을 자처하는 ‘시장경제화’.
이중적인 체제, 이중적인 사회, 이중적인 세대. 그러니 저자가 볼 때 한국 대중이 한정된 정보로 접하는 아전인수식 분석으론 어림도 없을 수밖에. 현실과 따로 노는 정보란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방법은 하나란다. ‘관광용 인민’과 ‘취재용 시민’을 넘어 진짜 그들의 속을 열어보는 것. 이렇게라도 추려낸 ‘그 속’을 제대로 봐달란다. 안다. 속살을 드러내긴 쉽지 않다. 더구나 감추는 게 많은 주민들이라지 않나. 다만 뭔가 ‘턱’ 걸리는 밑그림이 문제다. 구석구석에서 쏟아지는 고민·숙제 말이다. 세상에 쉬운 혁명이 없듯 쉬운 욕망도 없을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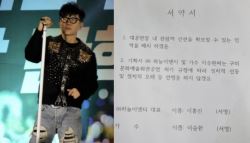

!['7억8000만원' 로또 1등 남편 살해한 여성이 한 말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4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