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의 대도시와 소도시 할 것 없이 일회용품 규제의 정착 수준은 높다.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남부의 프라이부르크와 하이델베르크, 독일 환경청이 있는 데사우 등 5곳의 호텔은 일회용품 일체를 제공하지 않았다. 3~4성급 호텔에 일회용 슬리퍼와 일회용 세제 도구가 없을 것이란 예상은 못했다. 심지어 플라스틱 생수병에 담긴 먹는 물 역시 제공하지 않았다. 당장 마트에 들러 비누와 마실 물을 샀고, 비누는 고이 싸서 호텔을 이동할 때마다 들고다녔다.
거의 대부분의 커피전문점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없었으며, 대신 종이컵이나 리유저블컵을 줬다. 우유 거품이 묻은 리유저블컵은 휴지로 닦아내 가방에 넣어다녀야한다.
|
또 독일의 배달 용기는 국물이 새지 않게 용기 상단을 비닐로 접착하는 한국과 달리 뚜껑을 얹은 식이다. 음식을 포장했을 때 균형을 맞춰 잘 들고 가지 않으면 난처해질 수 있다. 모든 독일의 일회용 포장재가 그렇듯 종이백의 두께는 정말 얇고, 우려대로 쉽게 뜯어졌다. 플라스틱에 비닐 등이 접착제로 붙어 있으면 복합재질로 되어 재활용이 어려워진다.
우리에겐 생소하고 불편한 생활방식을 수용케하는 독일인들의 동력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소매점의 참여가 다국적 기업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란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독일 스타벅스는 보증금을 받긴하지만 소매점에선 볼 수 없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아직 사용 중이다.
이는 독일의 친환경 소비행태가 강력한 국가통제로 유명한 독일의 관료주의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리유저블컵의 경우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의 친환경 생태계에 독일 정부가 뒤따라 움직인 형태다.
독일의 윤리소비는 시장의 판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 현지의 분석이다. 특히 경쟁적인 시장일수록 윤리소비를 하려는 독일인들의 소비성향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
한국에도 프라이부르크컵으로 잘 알려진 시티컵(City Cup)은 민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난해 운영을 중단했다. 리컵 외에도 다양한 리유저블컵과 용기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글로벌 프랜차이즈는 자체 브랜드의 리유저블컵을 포장재법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독일은 자체 플라스틱 포장재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 케이터링, 배달 서비스 및 레스토랑은 재사용(리유저블) 포장재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5명 이하 기업과 사업장 규모 80㎡ 이하는 예외다. 이 법률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스타벅스 아이스 음료 플라스틱 컵도 ‘재사용 가능 포장재’ 제공 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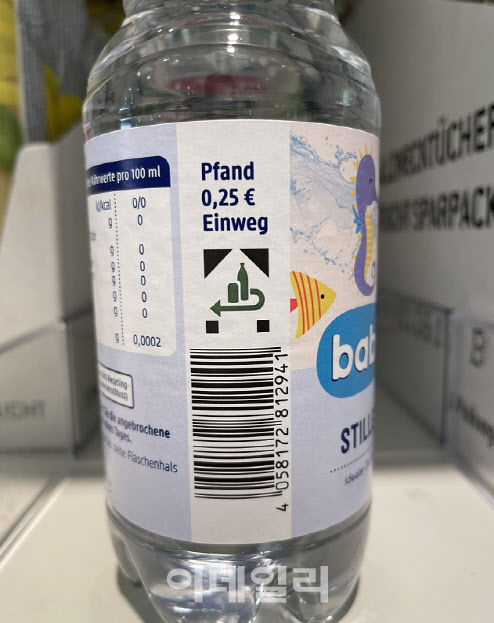





![공정위, 현대건설 현장조사…‘尹관저 골프장 공사' 정조준[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20134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