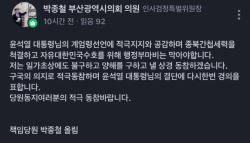|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장면 하나. 1983년 개관했다. 간판은 ‘가나화랑’으로 걸었다. 5년 뒤인 1988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둥지’를 마련하고 몸집을 다졌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꼬박 40년이었다. 이름도 바꾸고 대표도 바뀌었지만 한 번의 외도 없이 한 곳을 지켰다. 인사동·삼청동을 거쳐 청담동·부암동이 뜨든 말든 꿈쩍도 안 했다. 자리만 지켰나. 묵직한 무게감을 가진 작가를 선호하는 취향도 그대로였다. 어찌 보면 우직하고 달리 보면 고지식했다. ‘가나아트’ 얘기다.
#장면 둘. 태생부터 특이했다. 천안이 고향이니. 1989년 아라리오화랑으로 개관한 뒤 2002년 충남 천안시에 당시로선 국내 최대 규모라 할 문화공간을 마련했다. 독특한 행보는 그치지 않았다. 3년 뒤인 2005년 중국 베이징에 지점을 내고, 그 이듬해인 2006년 드디어 서울로 입성, 종로구 소격동에 서울점을 냈다. 이후도 참 변화무쌍했다. 2014년 베이징점을 상하이로 이전, 2011년 서울 청담동에 지점을 냈다가 접기도 하는 등. ‘아라리오갤러리’ 얘기다.
성격과 보폭은 다르지만 미술계에선 이미 선굵은 입지를 구축한 두 중견갤러리. 이들이 올봄 심상찮은 발을 뗐다. 각각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사관로,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에 새 지점을 내고 ‘변화’를 예고한 거다. ‘가나아트 한남’과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라이즈호텔’이다. 가나아트로선 첫 지점인 2호점이고, 아라리오갤러리는 공식적으로 4호점이다. 두 갤러리가 선택한 장소가 말해주듯 목적은 하나다. ‘젊음 저격’. 젊은 작가와 트렌드, 관람객을 좇아 갤러리가 회춘하겠다는 뜻이다. ‘청년·실험·도전·치기·모험’에 목말랐던 이들이 혈기 꿈틀대는 핫플레이스에서 제대로 판을 벌리겠다는 의지기도 하고.
△27세 개관작가로 승부수 ‘가나아트’
펜을 기관총처럼 든 인물(‘2016년이 끝나간다’ 2018)이, 달랑 머리뿐인 생선을 올린 식탁(‘생선머리’ 2018)이 보인다. 제각각 다른 시각을 가리키는 시계머리를 따온 그림(‘멀티플 클락’ 2016)을 지나니, 붉은 벽돌 패널에 ‘아빠사랑’이라 적은 노트며 물감이니 연필 따위가 붙은 입체작품(‘난 아빠를 사랑해’ 2017)이 기다린다. 마치 어린아이가 낙서하듯 펼쳐놓은 작품들은 순수하다고 해야 할까 단순하다고 해야 할까.
|
가나아트 한남이 개관전으로 선택한 작가는 1991년생 장유희(27)다. 자유분방한 표현력 하나로 가로세로 150㎝를 넘긴 100호 대작, 세라믹 재료의 아기자기한 조각을 오가는 ‘젊디젊은’ 작가다. 미국서 유학 중인 20대 작가가 국내서 연 이번 첫 개인전의 타이틀은 ‘해야 할 일’. 30여 점의 회화·입체로 꾸린 전시내용은 타이틀이 말해주는 그대로다. 하루의 계획과 생각에 대한 기록 등을 스케치로 확장하고 작품으로 연결했다는 것. 오죽하면 시계그림의 시침·분침이 가리키는 것도 그저 기상·식사·취침시간이라고 할까. 결국 일상의 소소한 소품과 메모, 그 위에 붙인 상상력 등이 작가가 형상화한 작품의 전부인 셈이다.
|
남다른 비중의 중장년작가 세우기에 주력해왔다. 그러던 가나아트가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용기’를 낸 건 역시 장소영향이 크다. 이태원·해방촌을 끼고 있는 가나아트 한남은 ‘사운즈 한남’이란 복합문화공간에 자리를 잡았다. 식당·카페·꽃집·서점·갤러리 등 14개의 상업시설이 14채의 주거공간을 떠받든 새로운 콘셉트의 건물이다. 이 안에서만큼은 장소가 상징일 터. 그러니 굳이 넓을 필요도 없다는 듯, 갤러리는 예상을 깬 60㎡(약 18평)의 아담한 규모다.
이정용 가나아트 대표는 “그간 무게감이 가둔 가나아트의 이미지를 벗겨내는 데 힘을 쏟았다”며 “여가·예술·거주가 공존하는 공간에서 문턱 낮춘 미술의 대중화를 시도해 볼 생각”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개관은 했다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바쁠 수밖에. ‘젊음’은 그에겐 아직도 생소한 영역이다. 이 대표는 “튀는 작가, 국내외서 동시에 통할 젊은 작가를 계속 찾고 있다”며 “내년쯤 돼야 제대로 된 기획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조짐은 좋다. 개관전에 걸고 세운 작품들이 ‘솔드 아웃’으로 가는 모양이다. 작품을 산 이들은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이 대세. 기존 가나아트의 컬렉터와는 확연히 다른 세대란 점도 일단 ‘성공’이다. 전시는 5월 27일까지.
△홍대문화 본질 찾겠단 야심 ‘아라리오갤러리’
430㎡(약 130평)의 운동장만한 공간에 파닥파닥 뛰는 젊음이 놓였다. 대형회화가 보이고 10분이 넘는 영상에다가 금붙이가 번쩍거리는 조각, 하다못해 사진에 자수를 놓은 기발한 설치작품도 보인다. 일본(아츠로 테루누마·아사미 키요카와), 인도네시아(우지 하한), 중국(쉬바청), 한국(김인배·권하윤·돈선필) 등 아시아작가 7명이 30여 점을 출품한 전시 타이틀은 ‘기억하거나 망각하는’.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라이즈호텔이란 다소 긴 이름의 공간은 홍대입구 옛 서교호텔을 리모델링한 라이즈오토그래프컬렉션 지하 1층에 마련했다. 예술·패션·음식을 파트너십으로 삼았다는 신개념호텔과의 콜래보레이션인 셈이다. 그런 만큼 아라리오 라이즈가 지향하는 취지는 분명하다. ‘홍대’란 청년문화의 정신·지리적 본류를 되찾는 동시에 젊은 미술작가들의 실험·고민을 끌어안겠다는 거다. 문화흐름의 급류에 발빠른 올라타기를 반복해온 아라리오갤러리의 또 다른 야심작이다.
개관전은 1980년대 초반생인 30대 작가들이 주축을 이뤘다. 쉬바청은 도박에 미쳐가는 중국사회를 비난하는 ‘생존과 운명’(2016)이란 길이 8m짜리 대작그림을 걸었다. 시선은 현실에 두되 만화적 상상력을 끌어들여 뒤틀린 인간상을 묘사한 ‘풍자화’다. 사회현실 풍자는 아츠로 테루누마가 그린 ‘보이지 않는 노조미의 비전 콤플렉스’(2017)에도 고스란히 박혔다. 잠만 깨면 보이는 과한 자극에 이제 그만 눈을 감고 싶다는 작가의 탄식이 꽉 들어찬 작품이다.
|
도쿄거리에서 만난 이들을 촬영해 인화한 뒤 굳이 자수로 가면을 만들고 장식을 붙여 ‘도쿄몬스터’로 세우기도 했다. 아사미 키요카와의 사진설치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2017)다. 대형 쓰레기통에 온갖 금붙이쓰레기를 ‘버린’ 한국작가 돈선필의 ‘오와콘’(2018)도 눈길을 끈다. 버린 것은 물건이지만 놓은 것은 기억이란 발상.
아라리오 라이즈의 개관으로 아라리오갤러리의 전시라인업은 자연스러운 영역구분을 할 모양이다. 한국미술사의 굵직한 의미는 천안에 두고, 원로·중견작가는 소격동으로, 젊은 글로벌작가의 도전적인 문제작은 홍대로 헤쳐 모으는 식이다. 전시는 6월 17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