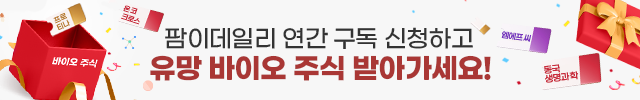[이데일리 조철현 사회부동산부 부장] 러다이트(The Luddite). 1800년대 초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벌어진 기계 파괴 운동이다. 당시 섬유노동자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등장한 방적기(직물생산기계)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기계를 부수고 공장에 불을 지르는 폭동을 일으켰다.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 지 200여년이 흐른 21세기의 한국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원격진료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얘기다.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에 맞서 3월 3일 총파업이라는 초강수까지 예고한 의료계를 보노라면 러다이트 망령이 돌아다니는 듯한 착각이 든다. 물론 기계를 부수는 원시적인 모습은 없다. 대신 시대 추세에 맞춰 변신을 꾀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기득권 지키기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형태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거동이 어려운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원격진료는 이미 세계적 추세다. 미국·호주·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원격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선 의사 대 환자 원격진료는 여전히 불법이다.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번번히 무산됐기 때문이다.
내친 김에 하나하나 따져보자. 원격진료는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게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원격진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 권한은 의사협회에 있지 않다. 그건 환자의 선택으로 가려질 문제이지 의사협회가 예단할 일이 아니다. 의사협회의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는 원격진료를 도입해 보면 금세 드러날 것이다.
의료 접근성에 대한 개념도 시대 변화에 따라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10여년 전만 해도 의료 소외라고 하면 멀어서 병원에 가기 힘들다는 ‘지리적인 소외’와 돈이 없어 못 가는 ‘경제적 소외’를 얘기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인 요즘에는 아무리 병원이 가까워도 몸이 불편해서 못 가는 ‘신체적 소외’가 더 큰 문제로 떠올랐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문밖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와병노인’이 늘어나면서 원격진료는 더이상 오지나 벽지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도시 독거노인 등에게 더욱 필요한 서비스가 된 것이다.
의사협회가 오진 가능성을 들먹이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데이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환자한테 겁부터 주고 보겠다는 거다. 대면진료를 하면 오진이 전혀 없다는 보장도 없지 않는가. 따라서 대면진료든 원격진료든 환자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환자가 서울·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동네병원과 중소 지방병원이 몰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이 주장이 맞든, 안 맞든 그건 둘째 문제다.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됐다. 무슨 병원 먹여 살리자고 환자가 있나. 환자의 선택에 따라 도태되든, 새로운 진화를 하든 그건 병원이 알아서 하면 된다.
의사협회의 원격진료 반대론은 신기술과 혁신을 거부하는 러다이트 운동과 맞닿아 있다. 원격진료 반대는 자신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동원한 논리일 뿐이라는 얘기다. 현장의 의사들이 진단 기술의 진전이나 의료기기의 혁신을 몰랐을 리 없기 때문이다.
원격진료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특수지역 주민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원격진료는 ‘희망’이다. 그것만으로도 원격진료제 도입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