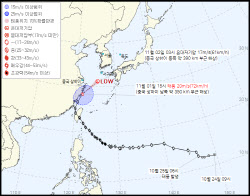|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단 앉고 보는 노상의 나무의자. 그 자리를 차지한 네 사람이 있다. 순서를 기다리는지 차를 기다리는지 알 순 없지만 기다림의 긴장감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저 맹맹한 표정으로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으니. 애정행각에 빠진 커플이 옆에 있든 없든.
그런데 신기한 노릇이다. 이 풍경을 ‘지하철’(Subway·2018)(안 혹은 대합실)이라 하겠다고 하니. 작가 최석운(60)의 눈이 말이다.
‘시대의 풍속화가’ ‘익살의 그림꾼’로 불리는 작가는 뭐 그리 대단할 것 없는 일상의 풍경을 뭐가 있는 듯 화면에 옮기는 각별한 재주가 있다. 말 기구에 올라탄 여인, 달빛 아래 쭈그린 남자, 여행지의 가족, 돼지 안은 남자 등등을 사각프레임이 꽉 차게 들여놓는 거다.
그 소소한 장면에 의미를 심은 건 색이다. 주황 셔츠를 입은 아주머니에겐 옥색 가방을 들리고 보라색 신발을 신겼다. 남자의 무릎에 턱 걸터앉은 여인에겐 푸른 원피스에 흰 구두를, 분홍 셔츠 아저씨의 양말은 초록색으로 골랐다.
결국 어느 하나 겹치지 않는 인생을 어느 하나 겹치지 않는 컬러로 대신 읽은 건 아닐지. 치열한 부조화로 압축한 공허한 삶의 조화. 어차피 이 시대의 풍속화가 그렇지 않은가.
30일까지 서울 강남구 언주로 갤러리나우서 여는 개인전 ‘화려한 풍경’(Splendid Scene)에서 볼 수 있다. 캔버스에 아크릴. 153×195㎝. 작가 소장. 갤러리나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