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스타벅스. ‘독주’란 표현이 딱이다. ‘외로운 레이스’하고는 거리가 멀다. 멀찌감치 추격자를 따돌리고 신나게 승승장구 중이니까. 지난해 한국에서 올린 매출액은 1조 5523억원(영업이익 1428억원). 동종 커피전문점 투썸플레이스 2742억원, 이디야 2004억원 등 넘버2, 넘버3가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도 이미 경쟁 자체가 안 된다. 바다 건너 옆동네들까지 보태면 27조원쯤 된단다. 달랑 커피만 팔아, 시쳇말로 ‘물장사’로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한 거다. 물량공세라고? 한 집 건너 한 집이 스타벅스 매장이니까? 미안하지만 그 논리로는 약발이 딸린다. 지난해까지 스타벅스 매장 수는 1262개. 투썸플레이스가 1067개로 살짝 못 미친다지만 이디야는 2407개나 된다니.
이쯤 되면 진짜 이유가 슬슬 궁금하다. 왜 우리는 오늘도 인파로 바글거리는 스타벅스 매장의 긴 줄에 동참하고 있는 건지, 다방 매출 신기록 행렬에 기꺼이 쌈짓돈을 보태고 있는 건지.
때마침 그 영업비밀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스타벅스의 성공신화를 분석한 두 권이다. ‘스타벅스화’와 ‘스타벅스 웨이’. 앞엣것이 한국화한 스타벅스의 진지전을 들여다봤다면, 뒤엣것은 글로벌화한 스타벅스의 기동전을 살핀다. 앞엣것이 한국의 사회학자가 ‘낭만적 가치’란 잣대로 대도시인의 공동체적 욕망을 꿰뚫어냈다면, 뒤엣것은 미국의 조직컨설턴트가 ‘보편적 가치’란 틀에서 세계인의 취향을 줄 세운 비결을 엮어낸다. 한마디로 한국 소비자와 스타벅스가 밀착할 수 있던 배경이고, 그들 경영자가 세계 커피시장을 평정할 수 있었던 전략이다.
결은 다르지만 양쪽 모두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다. ‘문화’란 거다. 세상이 감성과 이미지와 공간을 파는 ‘스벅문화’란 시스템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더란 건데. 맞다. ‘커피가 맛있다’로 뭉뚱그릴 게 아닌 거다. 이미 물장사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었더란 얘기다.
|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는 뜻이란다. 그런데 참 엉뚱하게도 스타벅스가 잘나가는 게 복세편살 덕이다? 책 ‘스타벅스화’를 관통하는 논지가 그렇다. 설명이 좀 필요하다. 요즘 이들이 중시하는 취향이란 게 있다. 이것이 다분히 양면적이다. 대체로 나홀로 향유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편으론 은근히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다. 취향의 딜레마라고 할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복잡한 심리구조가 바로 복세편살을 추구하는 과정이고 그 상황을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것이 스타벅스더라는 거다.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드러내는 줄타기가 여기서만큼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어떤가. 꽤 그럴듯하다. 스타벅스가 한국사회에서 성공했다면 소외감 중증에 빠진 대도시의 위기를 정확하게 간파한 덕이란 뜻이 된다. 복세편살도, 취향도, 스타벅스도, 나아가 그들이 그리는 트라이앵글까지 한국에서만 먹히는 구조란 거다. 그게 아니라면 하루 평균 50만명이 들락날락하는 진풍경을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도 봐야 하는데, 그건 아닌 듯하니.
적절한 도피처. 스타벅스가 제공한 공간을 저자는 ‘낭만적 탈주’가 활성화한 곳이라고 했다. 압도적이고 몰인정한 문화로부터 몸과 마음을 피신시키는, 사회가 강제한 선택이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선택이 가능한. 그것이 커피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든 “우유 대신 두유!”를 외치는 것이든 말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스타벅스로? 그곳엔 ‘예의 바른 무관심’이 있으니까. 혼자이되 혼자 아닌 스타일을 공유하고, 익명의 무리와 서로 간섭하지 않는 연대감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결국 책은 취향 저격을 원하는 이들의 성지라 할 스타벅스가 이제껏 없던 욕망과 가치를 업고 한국의 거리를 지배한 시간을 ‘스타벅스화’란 개념으로 풀어낸 것이다. 격화하는 시장과 기술개발이란 ‘객관문화’, 그런 객관문화를 거역하는 개인의 ‘주관문화’가 충돌하는 역학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이것일 터. 과연 이 그림이 소비자인 내가 스스로 그려낸 것인지, 문화자본이 된 그들이 또 강요한 것인지.
△첨단 팔되 전통 놓치지 않는 전략
좀더 밀도 있는 스타벅스의 경영전략은 책 ‘스타벅스 웨이’가 제공한다. 한국의 커피문화로 통째 몰아세워선 해결이 안 되는 틈새를 글로벌한 정보로 채울 수 있다고 할까. 1971년 커피애호가 셋이 미국 시애틀 작은 카페에서 원두판매점을 열었던 시작부터 세계 78개 시장에 2만 9000개 매장을 거느린 거대기업이 되기까지. 책은 그 씨실과 날실에 끼어 있는 리더십과 기업문화를 끄집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중 저자가 꼽은, 스타벅스 성공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간 중심의 ‘스타벅스 경험’이란 거다. 감성을 자극하는 브랜드 그 자체는 물론이고 신메뉴 개발, 공간 디자인, 직원 교육, 소셜미디어 운영까지,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물망처럼 펼쳤다는 그것 말이다. 그러곤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의 발언이 틀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에둘렀다. “커피 한 잔에 너무 거창한 임무를 지우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잠재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했더랬다.
한 가지 더, ‘전통을 놓치지 않는’ 방법론도 있다. 광범위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되 현장·지역 맞춤화로 혁신할 것, 과거를 간직하되 얽매이지는 말 것 등. 이는 ‘스타벅스화’에서 저자가 감탄해 마지않던 ‘노스탤지어 자극하기’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인데. 가령 서울 인사동 매장에 큼지막하게 걸린 한글 간판이니, 강릉 커피거리에 한국식 기와를 얹은 외관이니 하는 게 다 어쩌다 나온 장면이 아니란 소리다. 중국에선 검은깨 녹차와 월병을 팔고, 인도에선 탄두리 오븐에 구운 닭까지 내놓는다니.
두 권의 ‘스타벅스’로 판을 짜면 대략 답은 나온다. ‘기왕이면 스타벅스!’를 고집해온 무의식적인 행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말이다. 그렇다고 아쉬움이 없진 않다. 여전히 걸리적거리는 의구심이 남아서다. 커피문화든 도피문화든 스타벅스가 아닌 다른 데선 왜 안 된다는 건지. 커피값은 그들의 전략처럼 인간중심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건지. 결국 효율성, 예측·계산가능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맥도날드화의 세련된 변형이 아니라고 자신할 순 있는 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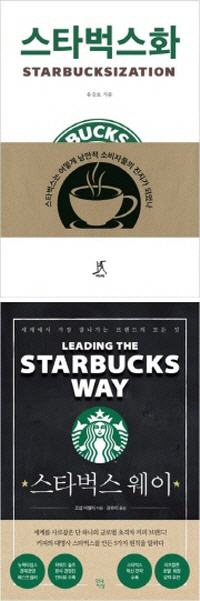




![‘세 명' 살리고 하늘로 간 ‘세 아이 엄마'…유족 “보고싶다” [따전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30072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