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민족적 자존심이 꺾이는 것은 유독 일본에 대해서는 얕잡아 보려는 우리의 집단 감정 때문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고, 아직 양국 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장점조차 일부러 과소평가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해마다 이 무렵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반복되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는 연구 풍토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그렇거니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한 우물을 파고들었던 수상자 본인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생리의학상을 받게 된 오무라 명예교수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3배나 더 많이 실패했다”고 밝힌 데서도 그러한 열정이 느껴진다. 중국 투유유 교수가 박사 학위자도 아니고 외국유학 경험이 없다는 사실도 기억할 만하다.
여기에 비한다면 우리 연구 풍토는 연구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흔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초분야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가 연구개발 혁신, 기초과학 집중투자 등의 목표를 내세우고도 거의 구호로만 그쳤던 사실도 반성해야 한다. 산업 분야의 실적이 늘어나더라도 원천 기술의 뒷받침이 없다면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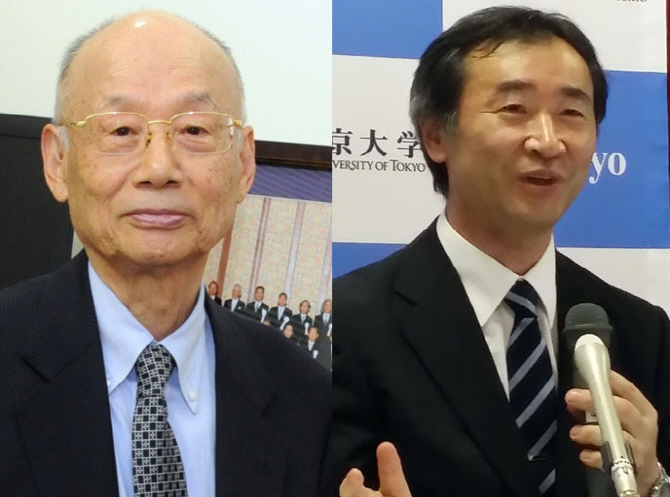





![천만원으로 매달 300만원 통장에... 벼랑끝 40대 가장의 '대반전'[주톡피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1803t.jpg)
![서초구 아파트 19층서 떨어진 여성 시신에 남은 '찔린 상처'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10001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