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나 자영업자로서는 현재 배달 수수료도 부담인데 더 올린다는 소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배달앱 입장에서는 여타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배달수수료 정상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설명이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배달비 프로모션(판촉활동) 잔치’가 막을 내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어떤 결말을 맺을지도 관심사다.
|
‘익숙해졌으니 요금을 더 내라’
최근 수수료 개편에 나선 국내 배달앱 시장의 분위기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배달앱 등장으로 무료 배달 시대가 막을 내린 뒤 소비자들은 오랜 기간 배달료 지불에 대한 적응기를 거쳤다. 때마침 늘어난 1인 가구에 코로나19 상황이 더해지면서 배달비 지불에 너그러운 인식이 자리 잡았다. 지역이나 거리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음식 가격의 20~30%를 아무렇지 않게 배달료로 내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배달앱 회사들의 적극적인 투자도 영향을 미쳤다. 음식가격이나 배달비 할인 쿠폰은 물론 ‘단건 배달’ 서비스까지 앞다퉈 제공하며 소비자들이 서비스에 젖어들게 하는 전략을 폈다. 이 여파 때문일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25조6783억원으로 2019년(9조7365억원)과 비교해 2년 새 2.6배 급성장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배달 앱들이 진행하던 프로모션(판촉 활동)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이 10개월간 단건 배달에 적용하던 배달수수료 정액제(1000원)를 정률제(수수료 12%)로 바꿨다. 같은 기간 배달료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되돌아가면서 프로모션 중단 신호탄을 쐈다. 주목할 점은 여론을 의식하던 과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달 서비스 입장에서는 단건 배달 경쟁이 장기화한데다 수년간 치른 마케팅 비용이 적잖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출혈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늘해진 시장 분위기 이면에 국내 배달앱 시장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배달서비스 3대장으로 꼽히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는 모두 해외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은 2019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분 87%를 4조7500억원에 인수했다. 지난해 새 주인을 찾은 요기요는 외국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와 퍼미라가 전체 지분의 80%를 들고 있다. 쿠팡 산하 음식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도 엄연한 미국 증시 상장사이자 해외 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회사다.
|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배달 앱 시장점유율은 △배달의 민족 57.7% △요기요 24.7% △쿠팡이츠 17.5% 등이다. 사실상 독과점이다. 국내에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인 해외 사업자나 PEF 운용사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것도 수수료 인상에 따른 업사이드(상승여력)를 노렸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배달서비스의 수익 구조는 시장 규모를 키운 뒤 소비자와 자영업자, 배달 서비스 사이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떼는 간단한 구조”라며 “이번 배달수수료 개편이 어쩌면 본격적인 시작점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배달음식 수요가 줄기 시작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올 들어 배달앱 이용자 수는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배달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448만명으로 전월보다 7만명 줄었다. 지난 1월(2476만명)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정점이던 지난해 8월(2503만명)과 비교하면 55만명이나 급감했다. 수년 내 실적을 끌어올려 새 주인에 팔아야 하는 PEF 운용사 입장에서도 수익개선 작업에 시동을 걸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관건은 ‘비싸다’는 자영업자·소비자와 ‘더는 수수료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배달앱 서비스간 입장 차이가 어떤 결말을 맺느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와 국회 안팎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자영업자와 배달앱 간 ‘갑을관계’를 막을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반면 배달앱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여파를 배달서비스 시장에도 적용해달라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배달앱 서비스 관계자는 “인건비와 유류비 인상,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수수료 인상을 더는 막을 수 없다”며 “수수료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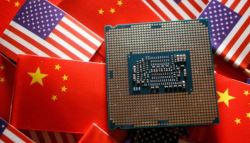
![저수지에 떠오른 검은색 가방…네살 배기 시신이었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30000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