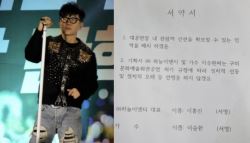|
발단은 이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달 초 총리실 일일간부회의에서 꺼냈다는 “천경자 화백 유족을 위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발언. ‘미인도’ 진위논란에 마음고생을 하는 천 화백 유족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나온 얘기로 알려졌다.
몇 주가 지나 뒤늦게 공개된 이 사안을 두고 ‘미인도’ 안팎 이해당사자의 심기가 거북해졌다. 당장 천 화백 유족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위로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들대로 지난 6월 유족이 낸 ‘미인도’ 재정신청의 결과에 ‘총리의 배려’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천 화백 유족은 지난해 12월 ‘미인도는 진품’이란 검찰수사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검찰이 기각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뜬금없다고 넘겨버릴 일인가. 그런데 이 사안, 영 석연치 않다. 여러 가지로 편치 않은 국면인 것이다. 우선 이 총리의 발언을 ‘흘린’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란 이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그가 누구냐’고 총리실에 대놓고 물어봤지만 통화에 응한 이들은 하나같이 ‘잘 모른다’다. 그럼에도 이 고위관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위로방안 검토’를 지시했던 건 사실인가 보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며 에둘렀다. 그러곤 총리가 의도했을 행간을 덧붙였다. ‘미인도’에 가린 천 화백을 작가로서 제대로 평가해주는 게 좋겠다는. 이어 ‘유족이 원하는 것’을 의논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이들과 접촉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말이다. 천 화백 유족은 관련 사안으로 문체부가 연락한 적이 없다고 일축해버린 거다.
왜 하필 지금인가. 한쪽에선 이 총리가 전남지사 시절 현지 미술관계자로부터 ‘미인도’ 얘기를 수차례 듣고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말한다. 천 화백의 고향은 전남 고흥. 그런데 만약 이 말대로 ‘지역성’이 엉켰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이미 전남을 떠난 총리가 아니던가. 객관성을 잃은 것처럼 비칠 수 있다. 또 하나. 국립현대미술관이 26년간 소리없이 품어온 ‘미인도’가 진품으로 결론난 데 대한 ‘무마성’이라도 단순치 않다.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하고 ‘특별전’을 여는 등 일각서 나온 위로방안의 진원지가 거기라면 이조차 적절치 않은 처신일 수 있다. 금관문화훈장은 2015년 천 화백이 타계한 당시에도 내놓지 않았던 거다.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라.’ 세상에 이보다 따뜻한 말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위로라고 할 땐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천 화백 유족의 고충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렇게만 따지자면 고통받은 작가, 유족이 어디 한둘이겠나 말이다. 게다가 아무리 흐뭇하게 봐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상급기관인 문체부가 나서는 ‘위로의 처방’이란 그림은 ‘초현실주의’다.
몇 해가 더 가도 아니 세기가 바뀌어도 해결이 안 날 수도 있는 불운의 미스터리는 이렇게 또 한번 꼬이게 됐다. 문제는 명쾌하지 않은 정황과 대처에서 나왔다. 해명조차 없으니 소설만 쌓일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