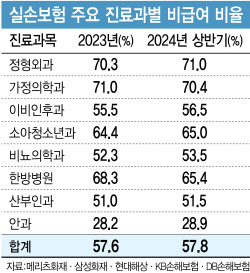|
게임은 전 세계의 산업 트렌드로 떠오른 ‘메타버스’와 직결된다. 글로벌 게임사들이 M&A로 다양한 지식재산권(IP) 및 플랫폼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게임은 주요 산업군 중 하나다. ‘3N’(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의 매출 규모만 따져도 약 7조 원대에 달한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게임사들은모바일 게임 시장을 중심으로 외형과 영향력을 키워왔다.
하지만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의 ‘임팩트’만 따져 보면 영향력은 상당히 미미하다. 글로벌에서 족적을 남긴 ‘K-게임’을 떠올려보면 내세울 만한 게임이 별로 없다. 엔씨소프트가 글로벌을 겨냥해 출시한 ‘리니지W’도 국내에선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지만, 대만 등 중화권 이외의 해외에서는 큰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요 PC 게임 플랫폼인 ‘스팀’에서도 국내 업체 중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곳이 없다.
최근 웹툰, 영화, 음악 등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일각에서 국내 게임사들을 향해 ‘우물 안 개구리’라고 표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매번 비슷한 콘텐츠, 비즈니스모델(BM)은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비판받는다.
최근 만난 게임 업체 관계자는 “그간 국내 업체들은 소위 당장 ‘돈 되는 게임’에만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어느 샌가 국내 게임의 발전이 정체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 수 아래로 무시했던 중국 업체들의 약진과도 비교된다. 중국 미호요의 ‘원신’의 경우 모바일, PC, 콘솔 등 멀티플랫폼으로 출시해 전 세계적인 히트작으로 거듭났다. 기술력, 작품성 등에서 K-게임을 넘어섰다는 평가까지 받는다. 국내 게임사들로선 뼈 아픈 대목이다. 지금은 텐센트, 소니, MS 등 글로벌 3대 게임사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급변하는 시기다. 장르와 콘텐츠는 물론 플랫폼간 영역도 허물어지고 있다. 이제 국내 게임사들도 외연을 넓히고 유연성을 키워야 할 시점이다. 내수에만 목매지 말고, 북미·유럽 시장의 수요도 가져와야 한다. 이를 위해 캐쥬얼한 모바일 게임 중심의 현 개발 흐름에서 벗어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성도가 높은 게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