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1980년 미국 대통령선거는 매우 특별했다. 당시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의 대선후보 로널드 레이건에게 표를 몰아줬다. 경제불황으로 인기가 없었던 민주당의 대통령 지미 카터 대신 레이건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당시 만들어진 말이 ‘레이건 데모크랫’(Reagan Democrats, 레이건을 지지하는 민주당원)이다.
36년 지난 지금 45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올해 대선판에 ’클린턴 리퍼블리컨‘(Clinton Republicans, 클린턴을 지지하는 공화당원)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전문지 더힐(The Hill)은 ’클린턴 리퍼블리컨‘이 이번 대선의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미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전 대통령의 참모 상당수가 클린턴 지지로 돌아선 상태다. 지난 8일 마이클 헤이든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존 네그로폰테 전 국무부 부장관, 로버트 졸릭 전 국부장관 등 공화당 소속의 전직 국가안보 관료 50명은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무모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하원의원은 지난주 “나는 공화당원이기 이전에 미국인”이라며 트럼프 반대 의사를 밝혔고, 리처드 한나(뉴욕) 하원의원도 “트럼프가 아닌 클린턴에게 표를 주겠다”고 선언했다.
공화당 전략가인 론 본진은 “성향이 확실한 공화당원들이 클린턴을 지지하는 날이 올 줄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트럼프의 막말로 심기가 불편했던 공화당원들이 완전히 돌아서게 된 계기는 미국의 전쟁 영웅에 대한 트럼프의 비하 발언이다.
트럼프가 이라크전 전사자인 후마윤 칸의 어머니가 민주당 전당대회 단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성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이슬람 전통 때문에) 발언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하하자 공화당원들은 트럼프가 마지막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전사자의 희생을 기리는 걸 국가 존립의 근간으로 생각한다. 특히 특히 공화당은 ’군인을 위한 정당‘으로 불릴 정도로 애국주의를 중시한다. 애국주의를 건드린 프럼프를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백악관 수석보좌관을 지냈고 공화당의 대선 경선 주자였던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측근이었던 샐리 브래드쇼는 최근 공화당을 탈당하면서 “트럼프가 이라크전에서 사망한 미군 후마윤 칸의 부모에게 혐오스러운 표현을 동원해 다투는 것을 보면서 그의 무원칙과 공화당 정신 결여에 탈당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여세를 몰아 공화당 출신의 전직 국무장관들을 포섭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러처드 닉슨과 제럴드 포드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 레이건 정부의 조지 슐츠, 조지 W 부시 정부의 콜린 파월과 콘돌리자 라이스에게 사람을 보내 지지 선언을 요청한 것이다.
미국의 국무장관은 정권의 상징으로 불리는 자리다. 무게가 남다르다. 미국의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국무장관 출신들은 공화당 출신이건 민주당 출신이건 힘든 직무를 이겨 낸 서로를 의자하고 존경한다”면서 “클린턴은 역대 국무장관들과의 동지애가 대단하다”고 평했다.
하지만 잇따른 공화당원들의 클린턴 지지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클린턴=기성 정치권‘이란 인식을 강화해 트럼프의 차별화를 더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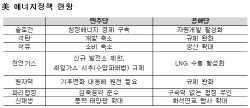


![“밀린 월세 받아올게” 실종된 집주인…23일 뒤 발견된 곳은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2/PS25021700102t.jpg)


![[단독]故 김새론, 개명하고 복귀 준비했는데 안타까운 사망(종합)](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2/PS25021700010t.jpg)